방대한 인도철학 사상체계 집성한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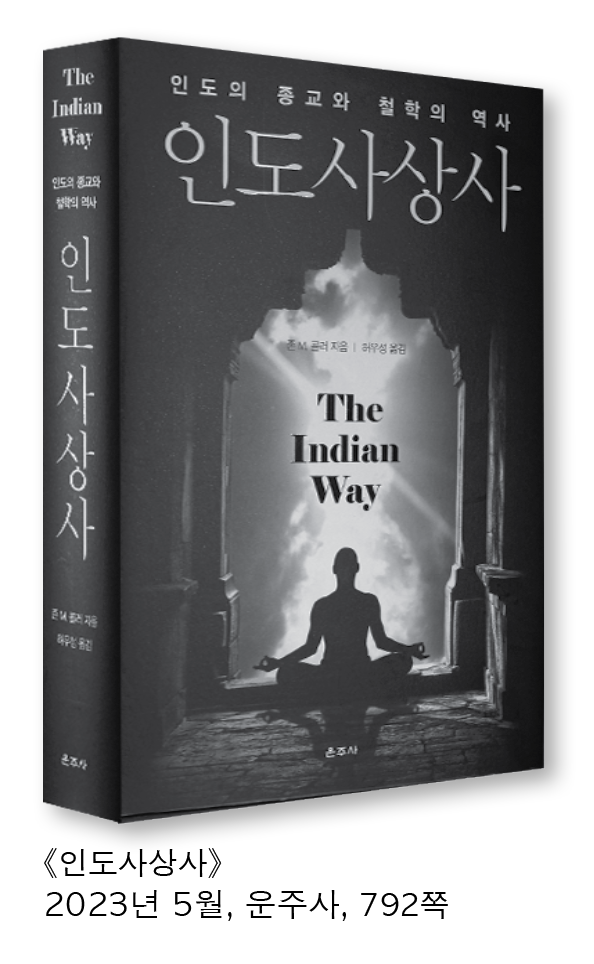
우리가 잘 아는 간디는 우리 사회가 갖는 사회악의 뿌리(roots of violence)를 7가지로 정의한 적이 있다. 첫째, 노동 없는 부. 둘째, 양심 없는 즐거움. 셋째, 특징 없는 지식. 넷째, 도덕 없는 상업. 다섯째, 인류애 없는 과학. 여섯째 희생 없는 숭배. 일곱째, 원칙 없는 정치가 그것이다. 이러한 그의 사상적 연원은 과연 어디에서 뿌리를 두고 가져왔을까.
한편, 과거와 현재, 고전과 미래, 신화와 세속이 동시에 숨쉬는 인도에서는 흔히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마하바라타》 속에 모두 있고, 《마하바라타》에 없는 것은 이 세상에도 있을 수 없다”고 한다. 《마하바라타》는 인도에서 《라마야나 이야기》와 함께 대표적인 고전 장편소설인데, 지금도 인도에서 만들어지는 상당수 영화나 드라마 속의 소재는 이러한 고전들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그만큼 인도의 과거 신화나 종교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옛 그림자가 아니라 미생물인 미토콘드리아가 지구의 생성 역사만큼이나 긴 진화의 역사를 자신의 유전자에 깊게 간직한 것처럼, 21세기 인도의 모든 사상 체계는 이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전히 살아 꿈틀대는 현재형의 역사이다.
한편 우스갯소리로, 글 쓰는 사람들 중에는 흔히 세 가지 권력의 유형이 있다고 말한다. 이를테면 법조인에게는 법조문의 권력, 의사에게는 처방전의 권력, 그리고 학자에게는 논문의 권력이 있다는 것인데, 이들은 각기 자신들에게 주어진 펜대의 권력(권위)을 휘둘러 타인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줄 수 있다. 한편 외래어로 출발한 원서를 도착지인 한국에서 번역하는 작업에는 이러한 펜대의 권력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그럼에도 간혹 소설가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영어로 옮겨 부커상을 수상한 데보라 레비(Deborah Levy)처럼 역자의 강력한 권한 행사도 아주 예외적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낯선 이국의 땅에서 아무런 수고로움도 하지 않은 원저자가 갖는 혜택보다 역자가 기울인 고단한 수고로움은 덜 평가받는, 아니 거의 평가받지 못하는 것이 한국의 현실임은 무척 안타깝다. 따라서 평자는 서두에서 오늘 소개할 책의 역자의 수고로움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본 서평을 시작하고 싶다.
경희대 철학과 명예교수이자 비폭력연구소 소장인 허우성 교수가 번역한 미국의 렌슬리어 폴리테크닉 인스티튜트의 동양철학/비교철학 교수인 존 M. 콜러(John M. Koller)의 《인도사상사: 인도의 종교와 철학의 역사(The Indian Way: An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ies and Religions)》는 인도인들의 장구한 역사와 문화를 한 권으로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한 입문서이다. 원서는 1982년에 초판, 2006년에 개정판이 나왔는데, 이에 따라 한국어 번역서도 1995년 《인도인의 길》 초판을 시작으로 2013년 재판을 거쳐 2023년 개정판까지 펴냄으로써 세 번의 긴 번역 과정을 거쳤다고 역자는 후기에서 밝히고 있다.
이 책은 인도인들이 걸어온 수천 년의 사상적 편력을 총 17장으로 치밀하게 구성하여, 글의 행간을 읽는 독자에게 다소 지루하고 난삽할 수 있는 인도의 복잡한 사상사 체계의 흐름을 시종일관 진지하면서도 때로는 가벼운 호흡으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풀어낸 역작이다. 인도의 사상 체계를 한 권에 담아내는 것 자체가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저자는 책 머리말에서 “인도 전통 속의 이념을 탐구하는 일은 정말로 신나는 모험이며, 세계 인구의 6분의 1에 가까운 사람들의 사유와 행동의 기초를 이해하는 데 지극히 실천적 모험”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는 서론에서 인도 전통이나 인도인들에게는 하나로 묶어 정의할 수 없는 다양성, 변화, 연속성의 특징이 있다고 설명한다.
이 책은 2장 인더스와 베다의 시원, 3장 베다에서 창조와 제의, 4장 우파니샤드, 5장 아뜨만과 다르마, 6장 자이나교, 7장 불교, 8장 요가, 9장 바가바드기타, 10장 크리슈나, 11장 칼리와 쉬바, 12~13장 인도철학의 주요 개념, 14장 인도의 이슬람교, 15장 시크교, 16장 근현대 힌두의 르네상스를 이룬 인도의 정신 지도자들, 17장 미래에 대한 전망의 순으로 고전에서 현대로의 긴 여정을 담고 있다.
800페이지에 가까운 두꺼운 책을 앞에서부터 읽을 필요는 없다. 인도의 시공간을 가로지르는 긴 스토리 전개는 독자에게 자칫 흥미를 잃게 할 수도 있으니, 독자 자신이 특별히 관심을 두는 내용을 찾아 먼저 읽어도 된다. 이는 마치 프랑스 현상학자 질 들뢰즈가 그의 책 《천 개의 고원》에서 말하는 리좀과도 같은데, 흙 표면 위에는 각기 독립적인 생명체로 보이지만 그 아래에서는 수많은 잔뿌리가 서로 얽혀 여기저기 싹을 틔우는 방식이다.
여기서 그는 나무식 유형의 책 읽기를 지양하라고 강조한다. 들뢰즈는 잎, 줄기, 몸통, 뿌리로 이어지는 고정된 나무 방식 형태(서론-본론-결론)의 기존 책과 달리, 여기저기 서로 다른 공간인 천 개의 고원처럼 자신의 책은 각기 독립적 이야기를 묶은 두꺼운 책이니 독자가 마음대로 펼쳐서 그냥 읽으면 된다고 친절히도 설명한다.
어쩌면 지금 소개하는 이 책도 리좀 유형의 책에 속할지 모르겠다. 따라서 평자도 이 책을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읽으라고 권하고 싶지 않다. 불교에만 관심 있는 사람은 책을 펼쳐서 279페이지에서 시작하는 〈제7장 붓다의 길〉을 읽으면 되고, 아니면 불교에는 관심이 없고 다만 시크교만 알고 싶은 사람은 645페이지를 펼쳐서 〈제15장 시크교도들의 신앙〉 편을 읽으면 된다. 이 책을 읽는 내내 저자가 시도한, 인도의 장편 서사를 엮어가는 끊임없는 탈주선과 도주선을 따라가게 되는데, 이 비선형적인 진화는 이질적 계열의 폭주선을 통해 고전에서 현대로 끊임없이 잔가지를 뻗어 인도 사상사의 복잡한 계통도의 얼개를 조금이나마 설정할 수 있게 한다.
그렇지만 독자는 인도라는 나라는 총 160만 제곱킬로미터 면적의 아대륙(亞大陸)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절반 정도이며, 러시아를 제외한 전 유럽 면적과 맞먹는 방대한 크기이다. 따라서 인도에서는 하나의 공용어, 하나의 종교만을 인정하지 않는다. 북쪽으로는 힌두쿠시산맥과 히말라야산맥이 있고, 그 아래에 인더스강, 갠지스강이 흐르며, 대륙의 중앙에는 데칸고원이 펼쳐져 있다. 거기에 지구인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리고 인도에서는 서양에서 말하는 ‘철학’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것도 주목할 필요도 있다.
인도인들은 자신들의 철학적, 종교적, 세속적 가치를 공유하는 이들을 한데 묶어 ‘~(견해)에 속한 이들’이라는 의미로 학파(學派)라 지칭하고, 이들의 사상을 ‘다르샤나’, 즉 견해라고 말한다. 이 다양한 견해들이 인도 사상사 혹은 인도 철학사라는 큰 바다로 면면히 흘러갈 뿐이다. 따라서 인도에는 힌두교가 없다. 그냥 베다 성전을 기초한 브라만 전통을 따르는 힌두 전통의 집단만이 있을 뿐이다. 서구식 사고와 잣대로 이들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는 “내 친구 중 한 사람은 인도 이념들의 전통적인 창고를, 매년 어떤 것을 집어넣으며 한 번도 청소한 적이 없었던 4천 년 묵은 다락방에 비유한 적이 있다.”(41쪽)며 인도 사상가들은 새로운 입장과 관점을 옛것에 보태고 있다고 말한다. 어쩌면 이것은 인도의 사상뿐 아니라 인도인들의 평범한 일상을 이해하는 단초가 될 수도 있겠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했던 번역의 수고로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중국 남북조 시대 양나라 혜교(慧皎, 497~554)가 저술한 《고승전》 제2권에는 불교의 위대한 역경가 구마라집(鳩摩羅什, Kumārajīva, 344~413)의 심경을 토로한 글이 나온다. “번역은 일단 씹은 밥을 다른 이에게 먹이는 것과 같다. 단지 맛을 잃게 할 뿐만 아니라 구역질까지 불러일으키게 한다(有似嚼飯與人 非徒失味乃令嘔噦也).” 구마라집도 자신의 번역 작업에 대한 고통을 이렇게 호소한 적이 있다. 번역은 허리와 허벅지와의 싸움이다. 이 책은 대단히 방대하고 전문적인 정보 또한 담고 있으며 분량도 상당하다. 원서가 한국의 독자들에게 쉽게 읽히도록 엄청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역자에게 재삼 감사를 표한다. ■
동광
본명 박대용.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석사 및 박사를 마쳤다. 연구분야는 디그나가의 아포하(apoha) 이론을 중심으로 한 불교인식논리학이다. 역서로 《불교 명상의 기원》 《자아와 무아: 분석철학과 현상학 그리고 인도철학의 관점》 등이 있으며, 근간 저서로 《디그나가의 아포하론》을 출간 예정이다. 현재 동국대 불교학술원 연구초빙교수이며 한국불교학회 편집위원장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