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왜 외젠 뷔르누프인가?
서구에서 불교학의 성립은 여러 경로를 통한 고전 문헌의 발견에서 비롯되고 있어 우리는 이 문헌 발견의 사회, 정치, 문화적 배경과 그 경로들을 파악하기 위해 영국에서 활동한 식민지 관료들의 학문적 업적들을 적시(摘示)한 바 있다. 고전 문헌들의 발견과 불교의 발견, 그리고 이 문헌들에 대한 정리는 불교학 성립의 결정적 계기였다. 그러나 이미 당시에도 이런 문헌 중시 태도에 대한 반성적 입장이 드러난다. 막대한 산스끄리뜨 불교 문헌을 수집하고 학계에 전파한 호지슨의 전기를 쓴 윌리엄 헌터 경은 이렇게 언급했다.
1828년에 발표된 호지슨의 첫 논문들의 출판은 유럽에 경이적 반응을 일으켰다. 학자들 사이에서 불교에 대한 신중한 생각들에 점차 지쳐가고 있었으며 그것이(불교) 과연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했던 때에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런 서구적 반응에 대해 호지슨의 불교 소개는 별 관심을 일으키지 못했고 모처럼 보내준 문헌 자료들은 캘커타의 아시아학회 도서관이나 포트윌리엄대학교 도서관에 묻혀 있을 뿐이었다.
이 문헌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실제로 그것들을 학문자료로 삼은 당사자는 외젠 뷔르누프뿐이었다. 당시의 정황을 뷔르누프는 이렇게 서술했다.
호지슨 씨가 이 내용의 두 콜렉션의 문헌들을 파리로 보내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그 문헌들이 한가롭게 도서관 서가에서 조용히 잠을 자고 있을 것이다.
결국 뷔르누프의 요청과 호지슨의 호의로 불교 자료들은 어렵게 프랑스에 도착했다. 그리고 뷔르누프는 그의 여생 15년을 오직 이 불교 문헌 연구와 번역에 바쳤고, 그의 역작인 《인도불교사 입문(Introduction à l’histoire du Bouddhisme indienne)》(1844)과 《법화경 역주(Le Lotus de la bonne loi)》(사후 1925년)를 내놓았다. 이렇게 출현한 이 두 저술이야말로 불교에 대한 문헌학적 방법과 비판적 접근을 통한 결실로 19세기 불교학의 정수이자 오늘날까지도 불교학의 전범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처음 뷔르누프가 접한 문헌은 《8천송 반야바라밀경(八千頌 般若波羅蜜經, Astasahasrika prajnaparamitasutra)》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 반야경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했고 오히려 “이 반야(般若, Prajnaparamita)를 얻은 자는 이익과 복덕을 얻을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 강조되고 있는 점에 의심을 지녔다. 도대체 이 반야(Prajna, 지혜)란 무엇인가?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데 그것을 알고 싶다”고 호지슨에게 물었다. 그리고 불교 문헌에서 드러나는 어휘와 되풀이되는 서술양식에 의구심을 품으며 불교 문헌들을 하나씩 판독하기 시작했다. “상당한 분량을 읽었지만 나는 아직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도 당신은 놀라지 않겠지요? ……모든 것이 나에게는 아직 모호하게 보일 뿐입니다.” 이것이 뷔르누프가 처음 접한 불전들에 대한 이해의 정도였는데, 당시의 불교 경전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처럼 불편하다는 인식을 벗어나지 못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훗날 막스 뮐러는 자신의 스승이 될 그와의 처음 상면을 이렇게 술회했다.
뷔르누프를 만나러 갔다. 정신적이고 친절하고 완전히 프랑스인다운 분위기였다. 나를 친절히 맞아 주었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가 말하는 내용은 가치 있고 특별한 내용들이어서 어느 것 하나 평범하지 않았다. 그는 “나는 브라만이고 불교도이고 조로아스터교 신자입니다. 나는 예수회 가톨릭을 싫어합니다”라고 고백했다. 나는 그의 강의를 기대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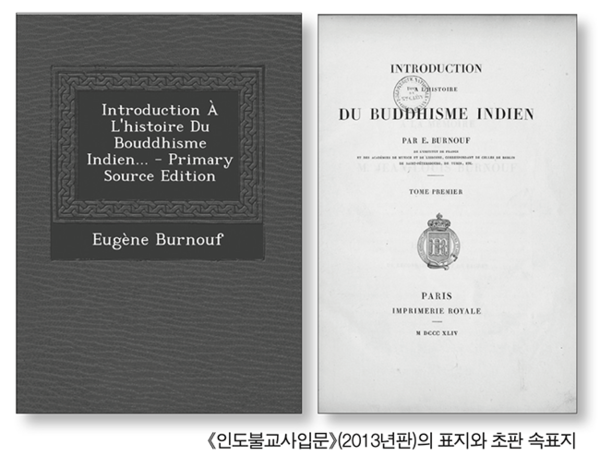
그를 가까이 접한 막스 뮐러의 증언이고 보면 뷔르누프의 학자적 위상이며 각기 다른 종교 전통을 객관화시키는 학문적 태도가 몸에 배어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다. 후에 종교학의 개창주라 추앙되는 막스 뮐러의 학문적 입지는 이런 뷔르누프의 학풍에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어떻든 이런 학문적 분위기와 개인적 취향을 지닌 그였지만 당시의 암중모색하던 불교의 면모들은 그의 손을 거쳐 일정한 틀을 지닌 형태로 정리 정착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저술 《인도불교사 입문》(이하 《입문》으로 약칭함)과 《법화경 역주》는 서구가 불교를 이해해가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엮은 글이자 서구의 학문 방법론까지 정착시킨 근대 불교학 연구의 전범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오늘날 그의 《입문》은 이미 때 지난 고전으로 거의 폐기 처분되어 누구도 읽으려 하지 않고 실제로 읽는 사람도 드문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잠시 이 책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바로 이 책에서 서구 불교학의 발단과 그 학문적 전개 과정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 오늘날까지 전수되는 서구 불교학의 학문적 태도와 접근 방법(Scholarship)의 여러 면모를 적시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D. 로페즈(David Lopez)는 불교학의 하나의 아이러니로 부각시키고 있다. 곧 로페즈는 “이 거작은 오늘날 잊히고 있다. 거의 읽히지도 않고 검토되지도 않는다. 이미 때 지난 책이 되었기 때문이거나 다른 책으로 대체되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불교의 주류를 대변하는 내용으로 완전히 동화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새로운 저작물들을 돕고 있으니 이제 더 가시적일 수 없게 되었다.” 마치 고전이란 누구나 언급하지만 그 누구도 읽지 않는다는 아이러니를 연상시키고 있으니 고전의 내용은 다른 저술에 인용 없이도 그대로 녹아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의 저술의 목차를 일람할 때 우리는 이미 어디서 본 듯한 기시감을 느끼게 된다. 그것은 지금 우리 주변의 불교 개론서들과 똑같은 순차와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불교학 학위 논문들과 비교할 때도 그 구성이며 설명방식이 대부분 그가 작성했던 방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오늘날 가장 참신한 학위 논문들이거나 학계에 큰 영향을 끼친 저술이라 할지라도 그가 채택한 방법인 경론의 사상적/역사적 해설과 함께 그 경론 원문에 대한 주석적 번역이라는 틀을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오늘날의 불교 개론서나 불교 입문서는 그대로 닮아 있다.
이 《입문》은 처음부터 교양인이나 전문가를 위한 입문서이거나 불교 안내서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이 《법화경》 이해에서 겪은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독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불교의 역사와 사상의 흐름을 정리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결실이 바로 이 《입문》이란 저술이었다. 즉 당시로서는 《법화경》을 위한 서론 격에 해당하는 것이 《입문》이었고, 결과적으로 교양인을 위한 서설로서 해설서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뷔르누프는 자신에게 문헌을 보내준 호지슨 경에게 1841년 10월 28일 자로 이런 편지를 보낸다.
나는 지금 이 경(《법화경》)에 몰입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좀 더 시간이 있고 밤낮으로 작업을 지속할 건강이 허락되었으면 합니다. 이 경의 어느 한 단편 조각이라도 정리하고 번역하지 않은 채로 미루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혼신을 다해 이번 겨울까지 마치려 합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출판업자를 찾아 이 《법화경의 분석 혹은 관견(管見)(Analysis or Observation on the
Saddharmapundarikasutra)》이란 책을 출간하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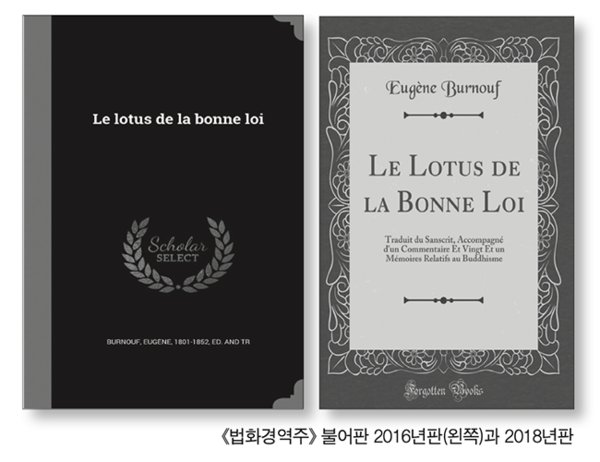
그러나 이 작업은 빛을 보지 못하고 이후 7년간 연장되어 계속 연구 번역되고 그의 사후에야 제자인 J. 폰 몰(Julius von Mohl)에 의해 《범본(梵本) 정법연화경(正法蓮華經) 번역본(Le Lotus de la bonne loi traduit du Sanscrit accompagné d’un commentaire et de vingt et un memoires relatifs au Buddhisme)》(1852)으로 출간되었다. 뷔르누프 자신도 이 《법화경》에 대해 이 ‘기이한(biarre)’ 경전 번역에 앞서 이에 대한 서문을 썼으면 좋겠다는 소회를 호지슨에게 보낸 편지에서 밝혔지만, 그는 전혀 엉뚱한 또 하나의 책을 3년 만인 1844년에 출간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인도불교사 입문》이라는 책이다. 곧 경전 번역과 번역된 경전의 이해를 돕는 책자로서 출현한 것이 이 불교학 입문서이다. 경전 번역과 그 이해라는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상관관계 속에서 불교학의 학문적 틀이 탄생한 것이다. 곧 경전 하나를 온전히 서구에 소개하기 위한 작업이 결국 불교학의 시발이 되었고 근대적 불교학의 학문 틀을 발주시킨 셈이다.
이 대작은 당시의 유럽 지성들에게 열독 되었고 파급력이 광범위했다. 따라서 ‘오리엔탈 르네상스(Renaissence Orientale)’로 지칭되는 계몽주의, 낭만주의의 지적 분위기는 독일 사상가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쇼펜하우어와 니체, 또는 셸링 등이 탐독하였고 그들의 사상 형성에 불교 사상이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바그너의 오페라에도 영향을 미쳤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창 신생 국가로 떠오른 미국 사상가들에게도 이 책은 큰 영향을 끼쳤다. 헨리 D. 소로(Henry David Thoreau, 1817~1862)의 자연사상이나 랄프 에머슨(Ralph Waldo Emerson, 1803~1882)의 초절주의(Transcendentalism)와도 무관하지 않다. 소로는 《법화경》 번역을 읽고 영문으로 다시 번역하여 《다이얼(The Dial)》이란 잡지에 게재했고, 인도사상과 불교를 강의하고 있던 예일대학의 에드워드 샐리스버리(Edward Elbridge Salisbury, 1814~1901)는 이 《법화경》을 소개하였다.
2. 서구 불교 이해의 명암: 열반이란?
문헌에 대한 객관적 접근과 학문적 확대는 응당 불교에 대해 공정한 이해를 이끌어냈어야 한다. 그러나 불교에 대한 문헌학적, 학문적 전개는 늘 우리가 예상한 방향으로만 전개된 것은 아니었다.
바로 뷔르누프에게서 산스끄리뜨를 수학한 제자이자 동료인 J. B. 생틸레르(Jules Barthélemy Saint-Hilaire, 1805~1895) 같은 학자도 불교의 사상적 특징을 적극적으로 표출하여 《부처님과 그의 종교(Le Bouddha et sa religion)》(1860)란 저술을 펴냈다. 그는 유럽의 지성을 대표하는 인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전 저작을 프랑스어로 완역할 정도로 서구사상을 대변하는 지성인이었다. 그러나 종교로서의 불교, 동양사상으로서의 불교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부정적이었다. 불교에 관한 책을 출간한 그의 목적과 관심은 전혀 달랐다. 그는 서구적 진리, 기독교 신앙의 위대성과 상치되는 점을 지닌 것이 불교임을 부각하고자 했다. 곧 불교의 가치나 불교의 공헌에 대해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뷔르누프가 정확하게 번역 소개한 불교의 기본 교설인 윤회, 열반을 오히려 서구 기독교적 관점에서 부정적인 허무주의로 해석했다.
부처님은 윤회를 믿고 있다. 그것이 그의 최초의 교설이지만 그의 최초의 실수이기도 하다. 불교에서는 무엇을 두고 영원한 구원이라 하는가? 오직 하나의 길, 열반(涅槃, nirvana)을 획득하는 일이다. 그것은 절멸(絶滅, annihilation)시키는 일이다. ……불교의 전 체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신(神)의 이념에 대한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다. 완전히 고립된 인간은 자신의 근원 속에 던져져 있을 뿐이다. 철저한 암흑 속에서 헤매며 지고한 무엇인가를 향한 영원의 빛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고전 문헌으로서 불교 경론들에 대한 번역과 주석은 문헌학으로서는 고도의 업적을 이룩했지만 사상, 종교로서의 수용은 전혀 별개의 문제였다. 객관성을 표방하며 불교를 학문의 대상으로 이끈 불교학 1세대들이었으나 불교에 대해 그들은 대부분 현실 부정의 허무주의적 종교로 받아들였다. 아직도 금세기 최대의 사전으로 불리는 《범영사전(梵英事典)》 편찬자인 옥스퍼드대학의 모니어 모니어 윌리엄스 경(Sir Monier Monier Williams, 1819~1899)의 태도는 정확히 이 경우에 해당한다. 그 역시 객관성을 표방하고 있었지만 정반대되는 내용의 글로 당시의 반불교적인 분위기를 대변했다.
다음에 나올 페이지에서 불교는 그 자체 속에 처음부터 질병, 부패, 죽음의 씨앗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 현재 상황은 급속히 분해, 퇴락되는 면을 지니고 있다. ……서서히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한때 교설의 규범에 충직했으며 방대한 인구를 장악하고 있던 힘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이다. 저항하려는 불교의 능력은 강력한 힘 앞에서 길을 비켜 가고 이 강력한 힘이 불교를 지상에서 쓸어버릴 운명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객관성을 표방했던 불교학자의 언표와 태도가 이러했다면 그 영향 아래 놓였던 서구 일반 지식인들의 인식과 평가는 어떠했을지 짐작이 간다. 어떻든 불교에 대한 서적과 문헌들은 광범위하게 전파되기 시작했다.
앞서 소개한 뷔르누프를 위시한 리즈 데이비즈(Thomas Rhys Davids, 1843~1922)의 빨리성전협회(Pali Text Society)의 불전들, 막스 뮐러(Max Müller, 1823~1900)의 불교 관계 문헌 소개들, 헤르만 올덴베르크(Hermann Oldenberg, 1854~1926)의 빨리 경전에 의거한 《부처님: 생애, 교리, 교단(Buddha; sein Leben, seine Lehre, seine Gemeinde)》(1881) 등의 저술이 광범위한 호응을 얻으며 퍼져 나갔다. 무엇보다도 E. 아널드(Edwin Arnold, 1832~ 1904)의 《아시아의 빛(The Light of Asia)》(1879)이란 시집은 서구의 중상류층에 큰 영향을 끼쳤다. 초기 불전에 나타난 부처님의 순수한 가르침과 참신성에 감명받은 것이다. 이 책은 100만 부 이상 팔렸고 아직도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올라 있다.
그러나 기독교의 선교주의적 반응은 달랐고 서구 불교 수용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었다. 인도와 스리랑카에서 선교사로 활약했던 리처드 콜린스(Richard Collins) 같은 기독교인의 대응이 대표적이다. 그는 그런 순수한 불교의 모습은 현장의 불교도 아니고 서구가 받아들인 감수성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아널드의 아시아의 빛인 부처님은 실제의 진실한 부처님상(像)일 수 없다. 마치 알프레드 테니슨의 아서 왕(King Arthur)이 실제 아서 왕의 상(像)일 수 없듯이 말이다.”라고. 불교는 문헌을 통해 이렇게 찬양과 반발이라는 이중적인 잣대를 지니고 서구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3. 불교 역수입의 현장
불교 문헌은 번역과 연구를 통해 일방적으로 서구로 전파된 것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역수입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우리에게는 한문 불전이 유일한 근거였지만, 근대기에 이르러 빨리, 산스끄리뜨를 통한 서구어 번역의 불전들과 그 영향이 오히려 동양으로 역수입되는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소위 신지학회(神智學會, Theospphical Society, 1875)가 올코트(Henry Steel Olcott, 1832~ 1907) 대령과 마담 블라바츠키(Helena Petrovena Blavatsky, 1831 ~1891)에 의해 설립되었는데, 이들은 스리랑카를 근거로 한 불교의 영향을 받으며 올코트는 《불교 교리 강요서(Buddhist Cate-chism)》(1881)를 출간했다.

근대기에 접어든 일본은 이 서양적 불교 이해의 교리서를 새롭게 바라보며 그를 초청하여 대단한 반향을 일으킨다. 빨리 불전 개요인 이 강요서는 대중적인 평이한 내용 때문에 일본에서 절찬리에 수용, 판매되었다. 말하자면 동아시아 불교국인 일본으로 서구어로 번안된 불교 경전이 역수입된 것이다. 한편 올코트는 혼잡스럽고 다양한 불교 전통들의 양태를 일관성 있게 묶으려는 포부를 지니고 남방불교를 중심으로 한 통일된 경전과 교리 및 의례, 법회의 단일화를 시도하였다. 기독교의 YMCA를 본뜬 YMBA(Young Men’s Buddhist Association) 등 새로운 신도 조직을 만들고, 불교기(佛敎旗)까지 제작하였다. 개신 기독교를 모델로 삼아 불교의 재구성을 시도한 이러한 일련의 근대기 불교개혁 운동을 훗날 학계에서는 “개신교적 불교(Protestant Buddhism)”라고 호칭하게 되었다.
이후 또 하나의 사건은 1893년 시카고 세계만국박람회의 부수적인 문화 행사로 ‘세계종교의회(World Parliament of Religions)’가 최초로 개최되었는데, 그 행사는 박람회 이상의 효과를 가져왔다. 이 회의를 통해 서구 불교학계는 동북아의 한문문화권의 대승불교를 거듭 확인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동북아시아불교를 대변하여 대승불교가 미국을 위시한 서구에 본격적으로 소개되었고 일본의 샤쿠 쇼엔(釋宗演, 1860~1919)은 제자인 D. T. 스즈키(Daisetz Teitaro Suzuki, 鈴木大拙 貞太郞, 1870~1966)와 함께 참석하여, 아시아 동북 한문권의 전통적인 대승불교를 소개했다.
이때 미국의 독일계 철학자인 폴 카루스(Paul Carus, 1852~1919)가 참석하며 본격적으로 북방 대승불교사상과 대승 경전들이 영역되어 퍼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카루스는 모니스트(Monism)로서 신칸트철학을 해석하며 불교에 대한 저술을 출간했는데, 《부처님의 복음(The Gospel of Buddha)》(1894), 《불교와 기독교의 비판(Buddhism and its Christian Critics)》(1894), 《업: 불교윤리(業, Karma: A Story of Buddhist Ethics)》(1903) 등이다.
한편 스즈키는 카루스의 연구소에서 본격적으로 불교 경전들을 영어로 소개하기 시작했다. 이후 스즈키는 미국에서 한문으로 된 대승불교사상의 정수인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을 Aśhva-gosha’s Discourse on the Awakening of Faith in the Mahaya-na(1900)란 제목으로 최초의 영역 번역서를 출간하고, 이후 영문으로 수많은 불교 저술을 펴냈다. 그 가운데 동북아시아 대승불교 전통의 선불교를 알리고자 《선불교 입문(An Introduction to Zen Buddhism)》(1934)을 집필하는 등, 일련의 선불교 관련 저술을 출간하여 동아시아 특징의 대승불교와 선 사상(Zen Buddhism)을 서구 학계에 소개하였다. 결국 서구에서 발견되고 번역된 불교는 신행에 앞서 이렇게 학문적인 저술로 변모되어 동양으로 역수입되는 한편, 동북아시아의 한문 불전들 역시 영어로 번역되어 다시 서구로 퍼져나갔다.
4. 불교를 접근하는 시각의 다양성
동양의 것은 이질적이고 신비롭기까지 한 대상으로 의식했던 서양 지성인들이 불교를 접하는 방식이나 불교를 보는 시각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불교 문헌들을 접한 서구의 학자나 지성인들의 반응은 각기 달랐다. 경전 번역에서부터 불교란 종교의 내용, 철학적 전개를 분석 정리하는 작업은 연구자, 곧 학자들의 입장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었다. 학자의 신분적 차이나 자신의 학문적 입장인 ‘스칼라십(Scholarship)’은 그래서 중요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서양의 각기 다른 사상 틀을 갖고 불교의 내용을 재단하는 작업은 비교론적인 입장에서 접근될 수밖에 없다. 이 비교론이 이끄는 서양학자들의 함정이랄까 그 한계는 일찍 E. 콘즈(Edward Conze, 1904~1979)에 의해 정확히 지적되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지만 불교에 대한 부정적 허무주의의 특징으로 오해된 무상, 무아, 열반에 대한 해석은 결국 서구 학계의 동향을 가름하는 요인으로 떠올랐다. 뷔르누프의 열반에 대한 해석과 중관, 공(Sunyata)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그 해석이 분분하다. 이 논쟁들은 결국 서구 불교학 1세대들 사이의 관건이 되는 주제로 떠올랐고 상호비판의 쟁점이 되기도 하였다. 뷔르누프의 제자인 생틸레르와 막스 뮐러, 그의 적통을 잇는 실뱅 레비(Sylvain Levi, 1863~1935)와 러시아 학자인 체르바츠키(Fyodor Stcherbatsky, 1866~1942) 사이에 공(空)에 대한 해석상의 충돌을 일으켰고, 이는 오늘날까지 각기 다른 학문적 경향을 대변하는 원인이 되었다. 곧 ‘공은 없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해석의 문제를 놓고 아직도 활발한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학자들 간의 논점의 차이는 확대되어 불교학 연구에서 프랑스학파, 영국학파, 레닌그라드학파의 형성을 이끌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실뱅 레비는 뷔르누프의 학문 경향을 이어 주로 유식학 연구에서 상당한 실적을 쌓으며 유식학 기본 문헌들을 번역했다. 실뱅 레비의 유식학 연구 덕분에 3 · 1 독립운동 사건 이후 프랑스로 피신한 김법린 박사(동국대학교 총장 역임) 같은 분이 그의 문하에서 〈유식 20송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기도 했다. 실뱅 레비는 또 프랑스 인문학의 연구 중심인 고등연구원(Ȇco-le pratique des haute Ȇtude)에서 활동하며 사회인류학을 가름하는 마르셀 모스(Marcel Mauss, 1872~1950)와 에밀 뒤르켐(Emile Durkheim, 1858~1917)에게도 학문적 영향을 끼쳤다. 이후 그의 학통은 벨기에 출신의 드 라 발레 푸생(Louis de La Vallee Poussin, 1869~1938)에게 연결되고, 그 학통에서 금세기에 ‘대체가 불가능(irrepaceable)’하다는 최대의 찬사를 받는 현대 불교학의 거장 에티엔 라모트(Etienne Lamotte, 1903~1983)가 출현하였다. 그리고 서구 학계는 라모트의 《인도불교사(Histoire du Bouddhisme indien)》(1958)는 바로 뷔르누프의 《인도 불교사 입문》의 전통을 이어받은 서구 불교학의 적통인 저술로 뷔르누프를 전승한 것으로 공인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바로 라모트에게서 서구적 불교 연구인 빨리, 산스끄리뜨 원전에 의한 연구와 비판적 비교론적 분석을 전수한 학자가 한국불교연구원 창설자 이기영(1922~1996)이다.
한편 푸생은 열반 연구, 바수반두의 《아비달마구사론(阿毘達磨俱舍論)》을 비롯, 현장(玄奘)의 《성유식론(成唯識論)》 연구 등 유식학 연구의 이정표를 만들었다. 푸생의 열반에 대한 연구는 곧바로 논쟁을 일으켜 열반은 절멸(絶滅)이란 부정적이며 허무주의적 해석으로 이끄는 측과 오히려 열락(悅樂)이라는 긍정적 구원론으로 해석하는 두 갈래를 낳았다. 그런 해석은 확대되어 중관, 공 사상에 대한 상반된 견해마저 낳게 되었다. 즉 뷔르누프를 이어 푸생은 ‘순수한 니힐리즘’으로 중관 해석을 제시하며 대승불교 사상의 학술적 대변자를 자임하게 되었고, 빨리 경장에 의거한 리즈 데이비스나 헤르만 올덴베르크와 차별화를 꾀하게 되었다.
푸생은 빨리 경장만으로 불교사상 전반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하며 산스끄리뜨와 티베트 장경에 근거한 대승사상을 현양하고자 했다. 곧 용수의 《중론송(中論頌, Mulamadhyamakakarika)》과 월칭(月稱, Candrakirti)의 주석본 《쁘라산나빠다(Prasannapada)》를 통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초기의 순수한 불교에서 제시되는 열반은 중관론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그 내면적인 내용은 결코 니힐리즘이거나 절멸의 상태가 아닌 오히려 “영원한 열락” “불멸의 영혼의 초월적 파라다이스로의 이행”이라고 천명했다. 이에 대해 레닌그라드의 체르바츠키(Fyodor Ippolitovich Stcherbatsky, 1866~1942)는 그런 해석이야말로 서구의 변신론적(辯神論的) 해석이라 비판하며 이런 평가는 서구의 구속론적(救贖論的) 입장의 반영이라고 나름대로 반론을 펼쳤다. 또 열반을 부정적 어휘로 파악하는 작업은 서구의 철학적 니힐리즘을 표방한 것이니 열반과 중관 공 사상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논박하였다.
그의 이런 입장은 G. R. 웰본을 통해 잘 지적되고 있다.
뷔르누프로부터 푸생의 저술에 이르기까지 열반이 무얼 의미하건 간에 중론에서의 공(空, 텅빔, voidness)은 이 학파를 완전히 허무주의적인 것으로 낙인찍었다. 제법(諸法)의 실재에 대한 중관적인 부정은 니힐리즘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한 것은 체르바츠키가 최초였다. “공(空), 곧 Sunyata는 ‘상대성(相對性, relativity)’이다”라고 선언했다. 사물들이 그 자체에서 상호 의존적 관계의 공함을 말하는 것이다.
결국 체르바츠키의 초기 저술인 《후기불교 교의의 인식론과 논리학(Theory of Knowledge and Logic in the Doctrine of the Later Buddhism)》(1903)은 그의 대저인 《불교 논리학(Buddhist Logic)》(1930)》 2권으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것을 기점으로 후기 유식철학자들의 관념론적 해석이 제시되면서 서구의 초기의 열반에 대한 이해들과는 차별화를 시도했다. 따라서 공에 대한 용수의 철학은 결코 허무주의적인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고, 공은 경험적 현상에 대한 실재를 부정할 뿐 ‘물-자체(thing-in-itself)’, 곧 ‘절대적인 것(the absolute)’의 실재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것은 ‘적극적 단일성(radical monism)’이고 중관 사상은 모든 실재의 ‘궁극적 단일성(oneness)’을 주장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최초로 불교 사상에 대한 칸트적 어휘인 “현상(phenomenon)과 실재(reality)”라는 이원론적 해석 방법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칸트 사상을 대변하는 개념 없는 순수한 직관이란 무용한 것이라는 명제가 차용되고, “내용 없는 사상이란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이란 맹목의 것이다”라는 칸트의 명제가 그대로 불교 인식론의 기초가 된다.
중관 사상 해석의 중심적 두 가지 틀인 세속제(世俗諦, samvriti-satya)와 진제(眞諦, paramartha-satya)는 움직일 수 없는 개념이다. 세속제는 인지적 지성을 통한 경험의 현실세계이고 진제는 순수지각에 의해 직접적으로 인식되는 궁극적이고 절대적 세계이니, 칸트의 “현상(phenomena)과 본질(noumena)”이란 틀에 그대로 접합된다. 결국 이런 해석 방법은 그동안 쇼펜하우어, 막스 뮐러, 도이센에 의해서도 일찍부터 불교철학의 설명 방식으로 채택되었다. 인식을 전제하지 않은 실재란 불가능하므로 모든 존재란 필연적으로 마음의 작용에 의해 존재하게 되니 여래장(如來藏, alayavijnana)이 마음의 궁극적 기저(基底)로 상정되며, 내적 직관의 과정들을 통해 여래장은 관찰된다고 해석했다.
아상가와 바수반두의 사상에 대한 해석이 뒤따르며 소위 디그나가(Dignaga)와 다르마끼르띠(Dharmakirti)에 대한 논리학파의 해석도 요청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렇게 당시 서구의 활짝 핀 이상주의적 관념론의 틀 속에서 불교의 철학적 명제들이 설명되고 심지어 니야야-바이세시카의 소박한 리얼리즘과도 대조적인 비교론으로 연구되었다. 즉 인도 6파철학 등 인도 사상 전반에 대한 연구 역시 이런 비교론적인 틀에서 활성화되었다.
오늘날까지도 중관 사상을 서구 학계에 가장 정확하게 석명한 무르티(T.R.V. Murti)의 명저인 《불교의 중심철학(The Central Philosophy of Buddhism)》(1955)》은 그런 서구 철학의 영향과 배경에서 서술되었으며 아직도 중관 사상을 대변하는 교과서로 기능하고 있다.
체르바츠키의 중관 사상을 칸트식으로 읽어가기와 무르티의 칸트식 재해석은 독일 관념론의 수입이라는 또 하나의 서구의 경제-정치적 영역을 넘은, 철학과 사상의 서구 중심적 수용으로 비판되기도 한다. 어떤 면으로는 지나친 동양적 오리엔탈리즘에 입각한 평가라고 할 수 있지만 세밀한 검토와 비판이 결여된 오늘의 우리 학계의 고민이고 곤경(predicament)일 수밖에 없다.
5. 중관과 논리실증주의와 비트겐슈타인
서구 철학계의 변화는 그대로 불교사상의 서구적 해석에도 영향을 미쳤다. 무어(G. E. Moore), 러셀(B. Russell). 에이어(A.J. Ayer) 등 소위 비엔나학파(Vienna Circle)의 논리실증주의 철학 방법론은 서구의 동양학자들에게도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용수는 일상의 세속적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거나 세속제(世俗諦)는 절대적인 것(眞諦)보다 열등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 그가 주장한 요점은 모든 것은 자성(自性, Svabhava)이 결여되어 있어 무(無)이고 공(空)하다는 것일 뿐이다. 세속적 실재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것은 공한 존재이고 절대적인 것과 일치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이 세상은 어떤 내재적인 실체도 지니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용수가 세계는 비실재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모든 존재 방식은 ‘실재와 현상’으로 이분화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종전의 칸트적 해석을 벗겨내고 있다.
오히려 용수의 주장을 논리실증주의적 과학적 접근이나 분석철학적 접근을 통해 달리 해석을 시도하였다. 용수를 변증법적 사상가로 보며 그의 공(空)이나 이제(二諦)에 대한 언표를 달리 접근한 것이다. 용수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그대로 인정했고(俗諦), 현실의 내재성이 없는 것도(眞諦)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 아무것도 부정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곧 용수의 “당신은 나를 논박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주장한 명제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언표를 중요시하였다. 또는 사구부정(四句否定, Catuskoti)의 불교 논리학파에 관심을 돌리기도 했다. 리처드 로빈슨(Richard Robinson)의 〈용수 체계의 논리적 측면(Some Logical Aspects of Nagarjuna’s Sys-tem)〉이란 1957년의 논문은 이런 분석 논리적 관점에서 중관 사상을 접근한 대표적 예가 된다.
다시 한번 서구 철학은 큰 방향 전환을 하게 되며 바로 비트겐슈타인의 사상이 그 중심에 위치하게 되었다. 따라서 분석철학과 연계되어 중론의 공(空)은 언어의 문제로 넘겨지며 실재, 본질을 따지던 이슈는 사라지게 된다. 곧 중관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인 공이나 진제/속제라는 개념은 존재하는 어떤 실체나 상태에 대해 이름 지어 언급한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었다.
공이란 표현체계 밖에 있는 어휘가 아니다. 오히려 그 안에 위치하는 중요한 어휘이다. 공을 실체화시키는 사람들은 상징(symbol)체계와 사실(fact)체계를 혼동시키고 있다. 어떤 형이상학적 사실이건 언어의 사실로부터 성립시킬 수는 없다.
곧 실재란 표현 불가능한 것이고 따라서 세계란 사실들의 집합일 뿐, 오직 경험적으로 증명될 수 있고 정당화된 신념 체계에 근거하게 된다. 그런데 용수는 사실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고 일정한 형식을 갖춘 언어 속에서의 진리 표현을 시도하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는 신비적으로 비치고 완곡법(婉曲法)으로 자기주장을 표현한다. 그렇게 되면 재현시키고, 정의하고, 지시하고, 그려내려는 의도들은 이완되어 약해지고, 강조하려는 표현들은 전후 맥락 속에서만 나타나게 된다.
거의 유행처럼 일반화되어 있는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의 기본적 개념들인 “언어게임(Language Game), 가족유사성(family resemb-lance), 사적 언어(private language), 삶의 형태(form of life), 일상언어(ordinary language)”란 개념들을 이런 중관의 공에 대한 신비화된 완곡법에 적용하는 것이다. 용수는 곧장 비트겐슈타인과 연계되고 그의 《중론송》을 읽어가는 불교학자들은 이제 마치 비트겐슈타인의 《철학 논고(Philosophical Investigation)》에 대한 해설로 그것을 읽으려 한다.
용수의 연기(緣起, pratityasamutpada)에 대한 의미와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게임의 유사성을 주목한다. 또는 언어체계에서 원자적 단위 요인들은 부정되고 각개의 요인들은 상호 의존할 때 연기이론과 이 가족유사성, 일상언어의 기능은 서로 상통하게 된다. 곧 용수가 주장하는 상호의존의 연기성과 비트겐슈타인의 주장들은 정확히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의 상호 의존성(緣起), 모든 개별 사물의 비존재성(無自性), 세상을 기술하는 언어는 임시로 약속에 의해 만들어졌을 뿐(假施設)이라는 불교의 언표는 비트겐슈타인의 관점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 그의 “언어의 한계는 나의 세계의 한계”란 표현은 용수의 “윤회의 한계는 열반의 한계”라는 말과도 서로 상통되고 “언어란 표상으로서의 의미”이고 “사용으로서의 의미”임을 지시하는 것이 가시설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런 비트겐슈타인적 관점과 불교를 비교하는 작업들의 대표적인 저술이 크리스 구드문센(Chris Gudmunsen)의 《비트겐슈타인과 불교(Witgenstein and Buddh-ism)》이다.
서양철학의 흐름을 따라 다음 단계로 후기 비트겐슈타인 철학 사상이나 후기 하이데거의 철학 사상들이 나타났다. 이 경향을 따라 불교사상에 대한 서양철학의 대비적 논술들도 역시 다양하게 나타났다. 소위 거대 담론을 벗어난 각양각색의 서구 사상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불교에 대해 접근하였다. 해체철학을 위시한 최근의 다변화된 철학 사상들이 각각의 입장에서 불교를 읽어가고 있으니 불교의 입장에서 이 사상들을 어떻게 읽어갈지 관건이 아닐 수 없다.

간과될 수 없는 하나의 독특한 관점을 주목하려 한다. 곧 이제껏 ‘개념적 분석’이나 ‘분석적 정의’에 의한 방법론을 통해 서양철학적 방법이 동양학자들에게 기여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시도가 제시된 것이다. F. 스트렝(Frederick Streng)의 《종교적 의미를 통한 공(空) 사상(Emptiness: A Study in Religious Meaning)》(1967)에 대한 접근이다. 종전의 철학적 접근과는 전혀 다른 시도로서 스트렝은 주로 ‘종교적 진리’ ‘종교적 지식’ ‘종교적 의미’ 그리고 ‘종교적 앎’이란 각도에서 공에 대해 새롭게 접근하고 있다. 곧 ‘종교적(religious)’이란 형용사적 시각을 통해 기왕의 철학적 접근으로 이끌었던 관점을 전환시키는 것이다. 그는 말한다.
공은 이제껏 거의 철학적 개념으로 천착되었다. 용수의 텍스트에는 분명 충분한 자료들이 있고 원인/결과, 실재, 존재, 지식과 같은 영원한(perennial) 문제들을 조직적으로 구성해온 저술들이 잇달았다. 체르바츠키, 케이트(A.B. Keith), 무르티, 프라우발르너(E. Frauwllner)의 연구를 기억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것들은 철학적 관점에서 행한 작업을 지시한다. …… 나 자신이 관심을 두는 것은 그런 것과는 좀 다른 어떤 것이다.
이제껏 불교 연구는 1)서구 전통 철학적 관점이나 2)역사 문헌학적 방법을 통해 중관 사상을 철학자들이 아닌 인물들 곧 라 발레 푸생, 다스굽타(Dasgupta), 라모트 등이 추구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기존의 관점을 탈피하여 ‘종교적인 앎’과 ‘언어 표현의 형태(form of verbal expression)’란 두 관계를 조사함으로써 공의 내용을 밝히고 있다.
공을 ‘종교적 삶의 형태’의 표현으로서 또는 ‘종교적 언어게임’의 한 부분으로 파악하려 시도하는 것이다. 곧 공은 인도적 혹은 불교라는 종교적 삶을 전제로 시작되고 그것에 구원론적(soteological), 치료적(therapeutic) 의도가 있다면 종교적인 게임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말이나 표현이란 인간 삶의 필요한 도구들이다. 그 말 자체 속에 의미를 지닌다거나 말의 체제를 벗어난 어떤 것을 지시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언어게임이나 삶의 형식이라 한 비트겐슈타인은 말의 의미는 그런 게임과 형식의 규칙을 따라 게임을 계속한다는 것이다. 형이상학적 추론들이란 따라서 ‘만들어진 것(假施設)’이고 철학은 이 말들이 어떤 특정한 맥락 속에서 사용되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결국 용수는 언표 속에서 말들의 상호관계란 실용적 가치에서 온 것이지 존재론적 위치를 지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스트렝의 종교적 언어에 대한 입장이다. 즉 이런 태도가 종교학적인 또 다른 접근의 시도라고 본다. 따라서 루돌프 오토나 미르체아 엘리아데와 같은 종교학자나 종교 현상학자들의 방법론을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용수의 입장은 절대주의나 허무주의나 또는 어떤 형태의 철학적 이데올로기(이념들)는 아니고 공이란 어휘는 전통적 담론체계 밖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용수의 어떤 어휘건 그것들을 ‘실체화’시키는 작업 자체는 오도되었다는 것이다. ‘절대적’이란 말은 사실의 질서를 따른 것이 아니라 서술적 질서의 한 부분일 뿐이다.
또는 무르티는 용수는 존재론적인 입장에서 사변적 이론을 제시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래서 중관론자의 입장에서의 철학은 개념의 틀을 통해 사물을 설명하려는 것은 아니고 이론에 대해 비판한다고 그것이 또 하나의 이론은 아니다. ‘공(空)함’이란 또 하나의 관점(drisiti)일 수도 없다. 그것에 대한 반성적 깨달음이다. B. K. 마틸랄(Matilal, 1935~1991)은 이렇게 말한다. “공은 하나의 견해 또는 입장으로 이끈다. 어떤 견해나 입장에서 빚어지는 환상을 치료하는 치유적 가치를 지닌다. 공을 하나의 입장(position)으로 여기는 일은 어리석다.” 여기서 소위 치유적인 기능으로서 공을 생각하는 것이다.
6. 지속되는 논의들
서구의 신세대 불교학자들은 이제 사유 주체마저 부정되는 공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느냐를 되물으며 그간의 서구 불교학계가 천착한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다시 제기한다.
주로 중관 불교 문헌 속에서 존재의 문제(Ontology)를 다시 끄집어내 중심 과제로 삼는다. 곧 틸레만스(Tom J.F. Tillemans) 같은 학자는 중관, 공 사상에 대해 거의 도발적인 표제를 제시한다. “중관론자들은 어떻게 사유하는가(How do Madhyamikas think?)” 하고 물으며 전통적 공관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이끌고 있다. 곧 불교는 있는 그대로의 존재를 수용하고 자연적인 인과법칙에 의한(因緣生, 因緣滅) 원리를 따른다. 소위 자연주의적 인과론에 입각해 있다. 이런 중관론적인 존재론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이겠는가를 되묻는 것이이다.
즉 최근의 불교학자들이 시도하는 인식론적 자연주의(epistemo-logical naturalism)를 표방한다. 경험론적인 과학에 근거한 인과율의 검증을 거칠 것을 요구하며 그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대해 질문을 제기한다. 소위 전통적인 철학의 정당성 확보(justification-oriented approach)에 만족하는 단계를 벗어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불교의 인식론을 지칭하는 마음의 철학에 대한 자연주의적 존재론(naturalistic ontology)의 방향을 추구하는 것이다.
7. 마치는 말
이렇게 되면 불교사상, 특히 그 중심에 있는 중관(中觀) 공(空) 사상은 현대의 언어철학이며 종교학적 접근까지 포함된 모든 부문에서의 탐색을 가능하게 하는 열린 학문 분야로 대두되었다. 이 밖에도 불교에 접근하는 다양한 시도들, 특히 인지과학을 위시한 여러 형태의 새로운 탐구들이 전개되고 있음은 최근 불교학계에서 주지의 사항들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필자의 한계를 넘어가고 있어 삼갈 수밖에 없다.
서구에서 불교학은 윌리엄 존스, 브라이언 호지슨과 외젠 뷔르누프 같은 동양 언어 문헌학자들이 정초를 닦은 이래로 인간 지적 활동의 한계를 도전하는, 미래로 열린 학문 분야임에 틀림이 없다. 이제껏 서술한 동양적인 사유에 대한 서구적인 비교론적 짝짓기 게임(Matching game)을 넘어선 지 이미 오래이고 다양한 새로운 전개들이 시도되고 있다. 동서를 넘어선 또 하나의 과제가 우리 앞에 제시된 셈이다.(끝) ■
이민용
동국대, 하버드대 박사과정 수료(인도불교사상, 동아시아지성사 전공). 동국대 · 영남대 교수, 한국불교연구원장 등 역임. 주요 논저로 《학문의 이종교배-왜 불교신학인가?》 《서구불교학의 창안과 오리엔탈리즘》 《미국의 일본 불교 수용의 굴절-헨리 올콧트, 폴 카루스, 釋宗演, D.T 스즈키의 경우》 등이 있다. 현재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