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의 사유체계와 불교문학의 가능성 모색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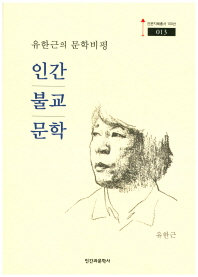
당시 젊은 평론가가 제기한 문제의식은 불교와 문학의 통로를 개척한 주목할 만한 저작으로 평가받았는데, 김운학의 《신라불교문학연구》(현암사, 1976)나 《불교문학의 이론》(일지사, 1981)이 경전 속에 나타난 문학성의 발굴 및 선시에 대한 본격적 연구로서 교과서적 위치를 점유한다면, 유한근의 《현대불교 문학의 이해》는 문학작품 속에 반영된 불교사상을 되짚어내, 특히 문학성을 밀도 높게 검증한 점에서 또 다른 불교문학의 정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무엇인가’란 문제의식을 불교의 사유체계 속에서 탐색한 이 책은 전통의 맥락에서 불전의 문학적 원형을 찾으려는 시도가 돋보인다. 예컨대 불교설화 및 향가, 선시는 물론 불교 사유의 신화적 수용양상까지 타진한 이 책은 불교와 문학의 연관을 광범위하게 확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밀교(탄트라)의 문학적 수용과정과 그 변용을 다룬 시론으로서, 독자적 위치를 점유한다.
특히 이 책은 불교만의 독특한 비유와 상징체계가 어떻게 현대문학 속으로 스며들었는지 그 양상을 밀도 깊게 탐색하고 있다. 그의 도발적 문제 제기는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으니, 가령 10구체 향가의 3구 6명(三句 六名)에서 ‘아야(阿耶)’ 등을 흥을 돋우기 위한 추임새로 바라본 기존 학설에 대하여, ‘아야’를 깨달음의 강력한 외침, 곧 ‘법열적 감탄’으로 바라본 것 등이 그 예다.
그에 따르면, 불교는 현실 초극의 종교이므로 초역사적, 초시대적 영원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불교 사유의 특징을 입체적 양면성으로 파악한다. 요컨대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이 그것이다. 여기서 상구보리는 현실 공간으로부터 벗어나 이상을 지향한 미적 공간이다. 그런 점에서 이는 서구의 댄디즘(Dandyism)과 유사하다는 것이며, 하화중생은 사랑을 통하여 타자와 합일하려는 ‘자아투여’의 사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것은 선동적 현실비판으로 하화중생을 해석한 견해와 반대 입장이며, 투쟁적 갈등을 부추기는 프로파간다와도 무관하다는 새로운 진단이다.
그는 불교와 유대교를 대표하는 경전 아함경과 탈무드의 비교문학적 접근을 통하여, 1) 제작연대 2) 비유구사 3) 서사양식의 측면에서 그 유사성을 밝혀내고 있다. 예를 들면 ‘죽음/여행, 부인/친구, 마음/선행’이란 상징성 사이의 친족관계를 고찰한 것이 그것이다.
2.
이번 책 《인간 불교 문학》은 《현대 불교문학의 이해》에 대한 통시적 관점을 축으로, 이를 공시적 관점으로 구체화한 책이다. 전통의 수용과 변형으로서 현대문학의 추이를 추적한 양상이 그렇다. 말하자면 이 책은 불교문학의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현장비평을 통하여, 현대문학 속에서 불교사상의 전개과정을 탐색하고 있다.
저자 유한근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는 약관에 신춘문예로 등단한 아동문학가이며, 대학 시절 이미 시집을 낸 시인이다. 뿐만 아니라 문학평론으로 다시 한번 신춘문예에 당선되었으며, 여러 권의 수필집을 낸 수필가이기도 하다. 조부로부터 익힌 한학 실력은 웬만한 전공자를 넘어서는 실력이며, 동서고금의 고전을 두루 섭렵한 독서가다.
그는 늘 시대를 앞서 내다본 탐험가이며, 사유의 융합을 온몸으로 실천해온 사상가이기도 하다. 21세기 문학을 앞서 전망한 ‘제3세대 비평문학’을 선도했으며, WWW 혁명의 시대를 간파한 ‘원 소스 멀티 유스’의 주창, 그리고 지금 그가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콘텐츠의 발굴 작업 ‘K-스토리’ 운동 등이 그 본보기다.
《인간 불교 문학》은 저자의 이런 사상적 바탕에서 출현한 저작이다. 흔히 불교적 사유를 재정립하거나 불교문학인에 대한 작품연구가 주류를 이루는 현실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지금 이 땅에서 쓰이고 있는 불교문학의 현장을 찾아 나선 행보는 새롭다.
저자의 이력에서 엿볼 수 있듯, 그 대상 또한 시, 소설, 수필을 아우르면서 동서양의 고전으로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니, 헤르만 헤세의 《싯다르타》 다시 읽기나 소동파에게서 선시를 찾아낸 것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소동파의 〈동림계성(東林溪聲)〉 〈지미(知迷)〉 〈동파비장성(東坡枇杖聲)〉 〈무하유(無何有)〉 등에서 오도의 경지를 확증한 눈빛은 예리하다.
이 책의 두드러진 점 중 하나가 불교문학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의 모색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저자가 다루고 있는 장르의 다양성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각 장르의 작가 선정 때문이다. 몇몇을 제외하면 작가들 거의가 문단에 알려지지 않은 문인들이란 사실이 그것이다. 말하자면 저자는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여, 그들의 작품 속에서 불교적 사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다. 짐작건대, 이 책에 소개된 대다수의 작가는 유한근에 의해 발굴되고, 문학성을 인정받은 사람들이 아닌가 싶다. 이것은 기존의 평가에 기대어, 그 공과를 논하는 작업과 반대의 경로다. 그렇다면 저자는 왜 그토록 위험한 모험을 고집하는 걸까.
그것은 그동안 저자가 보여준 삶의 궤적과 무관하지 않다. 요컨대, 그는 하나의 장르에 안주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늘 새로운 영역을 앞서 탐색하고 모험적인 시도를 실천해온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가 여러 매체를 통하여 신인 발굴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사실과도 겹쳐진다.
이 책의 편제가 ‘불교문학으로서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저자의 문학관을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는 연유도 거기서 찾아진다. 말하자면 저자가 설정한 하나의 문학관이 각각의 작가들 작품 속에 삼투되고 있는 양상 또한 이와 무관하게 보이지 않는다.
3.
그러므로 이 책 《인간 불교 문학》은 낚시질로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은 저자가 드리워놓은 사상적 낚싯바늘에 걸린 물고기를 낚아 올리는 형식 때문이다. 낚싯대를 드리운 채 저자는 마치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 같다. “이 바늘을 물어라! 그 죽음만이 해탈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말이다.
문학의 영원한 문제의식은 ‘인간은 무엇인가?’란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저자가 드리운 낚싯밥이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고타마 싯다르타를 출가에 이르게 한 번민이었을 뿐 아니라, 마침내 자신과 인류를 구원한 ‘부처’로 거듭나게 한 원동력이 아니었던가. 하지만 이 강력한 테마가 문학의 표면으로 떠오를 때, 관념화의 문제나 목적문학의 틀에 갇히게 된다는 아이러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한 우려와 고민은 이미 저자가 반복적으로 천명하고 있지만 말이다.
인간이란 명제는 불교의 첫 번째 화두이며, 모든 것이 귀결되는 수렴점이기도 하다. 문학이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형상화할 것인가를 거론할 때, 철학의 영역으로 진입한다. 그러니까 철학적 담론의 감성적 방편이 곧 문학인 셈이다. 그러므로 《인간, 불교, 문학》은 이미 인간 문제와 불교 사유, 그리고 문학적 형상화를 아우른 융합의 단초를 열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이것은 21세기,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그리고 로봇이 우리 삶의 깊숙한 곳까지 침투한 4차 산업시대, 인간의 역할을 새삼 생각하게 한다. 인간의 사유, 인간다움의 경계를 성찰할 때, 종교와 문학은 기계와 대항해야 할 시대의 마지막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저자가 내린 처방전 역시 ‘불교’와 ‘문학’인 셈이며, 그 해결책 또한 인간다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책의 제목이 ‘인간, 불교, 문학’인 까닭도 거기서 밝혀진다.
리뷰를 마치며, 저자에게 묻고 싶은 바가 없는 건 아니다. 불교문학의 아이덴티티를 현장비평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저자의 고민도 이 문제는 아니었을까? 질문을 문학으로 한정할 때마다 이 문제는 불거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니 말이다.
요컨대, 불교용어나 불교의례를 노출하는 글쓰기의 문제가 그것이다. 용어나 행위가 표면화됨으로써 생경한 관념화의 문제를 야기하거나, 심지어 종교와 문학을 혼동한 목적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종교적 신념 또한 내면화되고 문학적으로 승화가 필요한 건 아닌지?
무릇 전통은 침전과 혁신의 상호작용이다. 따라서 혁신이 부족한 전통주의는 위험하다. 이런 맥락에서, 이 시대의 불교문학은 뼈를 깎는 고민이 요구되는 건 아닌지?
물론, 이 질문은 필자가 작가들에게 보내는 강도 높은 주문이며, 그 책임 또한 그들의 몫으로 남겨질 테지만 말이다. ■
이경교
시인 · 명지전문대 문예창작과 교수. 동국대학교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현대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용운과 서정주 등에 대한 불교적 사유를 연구하여 《한국현대시 정신사》를 썼으며 《벽암록》을 알기 쉽게 번역한 책 등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