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남선-우리 문물은 다 불교적 감화에서 비롯된 것
1
텨……ㄹ썩, 텨……ㄹ썩, 텨ㄱ, 쏴……아.
때린다, 부순다, 무너버린다.
태산 같은 높은 뫼, 집채 같은 바윗돌이나,
요것이 무어야, 요게 무어야,
나의 큰 힘, 아느냐, 모르느냐, 호통까지 하면서,
때린다, 부순다, 무너 버린다.
텨……ㄹ썩, 텨……ㄹ썩, 텨ㄱ, 튜르릉, 콱.
(중략)3
텨……ㄹ썩, 텨……ㄹ썩, 텨ㄱ, 쏴……아.
나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가,
지금까지, 없거던, 통지하고 나서 보아라.
진시황, 나팔륜, 너희들이냐,
누구 누구 누구냐, 너의 역시 내게는 굽히도다.
나하고 겨룰 이 있건 오너라.
텨……ㄹ썩, 텨……ㄹ썩, 텨ㄱ, 튜르릉, 콱.
(중략)6
텨……ㄹ썩, 텨……ㄹ썩, 텨ㄱ, 쏴……아.
저 세상 저 사람 모두 미우나
그 중에서 똑 하나 사랑하는 일이 있으니
담 크고 순정한 소년배(少年輩)들이,
재롱처럼, 귀엽게 나의 품에 와서 안김이로다.
오나라 소년배 입 맞춰 주마
텨……ㄹ썩, 텨……ㄹ썩, 텨ㄱ, 튜르릉, 콱.— 최남선 〈해(海)에게서 소년(少年)에게〉 부분
총 6장으로 이뤄진 육당 최남선의 〈해(海)에게서 소년(少年)에게〉 부분이다. 1908년 11월, 18세의 나이로 직접 창간한 잡지 《소년》에 발표한 위 시가 소위 ‘신체시’로 우리 현대시의 효시로 평가받는다.
현대시 이전에는 신라 향가, 고려 속요, 조선 시조 등으로 대표되는 정형시만 쓰이고 노래 불렸다. 그러다 이 〈해에게서 소년에게〉에 와서 그 정형을 벗어났다. 주제도 제목처럼 바다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앞선 문물을 받아들이자는 계몽의식을 앞세워 전 시대와는 확연히 다른 시이다.

일본으로 유학 갔던 육당은 1908년 도쿄에서 최신 인쇄 기구를 사와 서울에서 출판사 신문관(新文館)을 차리고 《소년》을 펴냈다. 그 잡지에 권두시로 실려 이 나라 계몽을 위한 잡지 성격을 분명히 밝힌 시가 〈해에게서 소년에게〉이다. 바다를 화자(話者)로 내세워 바다에서 들어오는 해외 선진문물을 담 크고 순진한 어린이처럼 받아들여 새 나라를 만들자는 계몽시 계열로 보는 것이 문학계의 정설이다.
그러나 “때린다, 부순다, 무너버린다”는 막강한 힘, 진시황도 나폴레옹도 제압하는 권력, 그러면서도 담 크고 순진한 소년들은 끌어안는 자애로움으로 바다, 큰 파도나 해일을 다른 각도에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무소불위의 이 파도를 인도불교 초창기 불경 《숫타니파타》에 나오는 “매듭을 끊어 목숨을 잃어도 두려워 말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무소의 뿔’처럼 봐도 될 것이다.
“조선 고금의 문물은 직간접 불교의 감화를 받지 않은 것이 거의 없다”고 육당은 말했다. 우리 민족 거개가 그렇듯 육당도 어려서부터 불교적 분위기 속에서 자랐다. 10대에 《금강경》도 읽고, 특히 일본 유학 이후 일본불교에 잠식돼가는 우리 불교를 민족적, 사상적으로 연구해 불교연구사에 업적을 남기기도 했다.
그런 육당이었기에 〈해에게서 소년에게〉에도 ‘직간접 불교의 감화’가 들어 있지 않을 수 없다. 당나라 임제의현(臨濟義玄) 선사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祖師)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고 했다. 해탈에 이르기 위해 모든 가르침이나 권위에 구속되지 말고 무소의 뿔처럼 용맹정진하라는 것이다.
바다가 담 크고 순정한 마음들에 하는 말 형식을 빌린 〈해에게서 소년에게〉도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라. 또 바다 품에 안긴 담 크고 순정한 소년을 《화엄경》 〈입법계품(入法界品)〉에 나오는, 선지식(善知識)을 찾는 구도(求道)의 상징 인물인 선재 동자로 읽어보시라. 불퇴전의 용기가 샘솟지 않는가.
불자가 아니더라도 몇 번은 들어봤을 선재 동자 이야기나 선문답 이야기가 알게 모르게 〈해에게서 소년에게〉 착상과 전개에 끼어들었을 것이다. 이렇듯 고전시의 틀을 깨고 나온 우리 현대시의 효시 〈해에게서 소년에게〉도 불교적 감화에서 비롯됐다.
위하고 위한 구슬
싸고 다시 싸노매라때 묻고 이 빠짐을
님은 아니 탓하셔도바칠 제 성하옵도록
나는 애써 가왜라
(〈궁거워 1〉 전문)
모진가 하였더니
그대로 둥그도다부핀 줄 여겼더니
또 그대로 길차도다어떻다 말 못할 것이
님이신가 하노라(〈궁거워 4〉 전문)
열 번 옳으신 님
눈물지어 느끼면서도돌리다 못 돌리는
이 발길을 멈추고서저녁 해 엷은 빛 아래
눈 꽉 감고 섰소라
(〈떠나서 8〉 전문)
봄이 또 왔다 한다
오시기는 온 양하나동산에 피인 꽃이
언 가슴을 못 푸나니님 떠나 외론 적이면
겨울인가 하노라
(〈떠나서 9〉 전문)
육당이 1926년 펴낸 시조집 《백팔번뇌》에 실린 시편들이다. 《백팔번뇌》는 우리 현대시사에서 최초의 개인 시조집이다. 육당은 시조는 ‘조선인, 조선심, 조선어, 조선 음률 등 조선이라는 체로 걸러진 정수’라며 민족문학으로서 시조를 부흥하자 제창하고 나섰다.
《백팔번뇌》 〈자서(自書)〉에서도 “시조는 조선 문학의 정화(精華)며 조선 시가의 본류입니다. 조선인이 가지는 정신적 전통의 가장 오랜 실재며, 예술적 재산의 오직 하나인 형성”이라고 밝혔다. 그런 조선 문화의 원형(原型)인 시조 정형에 담아 불교에서 말하는 108개의 번뇌를 108편의 시로 염주 알 굴리듯 굴리려 한 시조집이 《백팔번뇌》이다.
위에 인용한 〈궁거워 1〉에선 님을 위해 애써 구슬을 싸고 또 싸매고 있다. 때 묻고 이 빠짐 없이 구슬을 성하게 싸매 님께 바치고 있다. 〈궁거워 4〉에선 님을 형상화해 보려 하고 있다. 모진가 했더니 둥글기도 하고 커다란 부피인가 했더니 길고 깊기도 해서, 형용할 수 없는 것이 님이라 했다.
〈떠나서 8〉에서는 “열 번 옳으신 님”과의 이별 상황을 그리고 있다. 차마 발길이 떼이지 않아 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님이 없어 박모(薄暮)의 어둠 속으로 들어갈 암담함을 떠올리고 있다. 〈떠나서 9〉에서는 님을 떠난 오늘의 현실을 그리고 있다. 님이 없으니 오는 봄도 봄 같지 않고 항상 언 가슴 겨울 같은 세상이란 것이다.
그렇다면 위 시편들에서 있을 땐 애써 위하고 또 위했으나, 이젠 떠나버려 시적 화자(話者)를 궁핍스럽게 하는 ‘님’은 누구일 것인가. 《백팔번뇌》 1부 첫머리에서 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반생의 지낸 길에서 그래도 봄빛이 마음에 떠나지 아니하고 목마르고 다리 아픈 줄을 도무지 모르기는 진실로 진실로 내 세계의 태양이신 그이-님이라는 그이가 있기 때문이다. (중략) 그이는 이미 늙었다. 사랑의 우물이 든 그의 눈에는 뿌연 주름이 비추게 되었고, 어여쁨의 두던이던 그 두 볼은 이미 찾을 수 없는 나라로 도망가 버렸다. 그러나 그에게 대한 그리움과 애 끊김과 바르르 떨리며 사족 쓸 수 없기는 이때 더욱 용솟음하고 철철 넘친다”고.
님은 “내 세계의 태양”이다. 그러나 님은 이미 늙어 찾을 수 없는 나라로 가버리고 없다. 그래도 그런 님에 대한 그리움과 애끓음은 더욱 철철 넘쳐난다는 것이다.
여기서 님은 인간적인 모습을 지닌 초월자, 부처님으로도 볼 수 있다. 간절히 수행, 추구하는 불법(佛法) 혹은 궁극의 진리로서 운주운항의 도(道)로도 볼 수 있다. 민족사와 민족 불교 연구에 몰두하며 ‘조선심’을 찾던 육당에게 이제는 식민치하로 들어간 조선이며 조선의 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고의 민족적 지성이며 민족계몽에 온몸을 불사르던 육당이었다. 그러나 1928년 일제가 우리 역사를 일본식으로 왜곡하려 설치한 조선사편수회에 촉탁으로 들어가고, 조선총독부 참의직을 맡아 친일(親日)의 길을 걸으며 변절자로 낙인 찍혔다. 그 친일이 육당 시에 나타난 ‘님’에 대한 이런 깊이 있는, 긍정적인 해석을 인색하게 하는 게 우리 현대시사이다.
변절자, 친일파임에도 우리 근대문화 초창기를 말할 때 모든 분야에서 최남선을 빼놓을 수는 없는 게 또 엄연한 사실이다. 불교와 불교문학을 논할 때도 제목부터 불교에서 따온 《백팔번뇌》는 물론이고 〈해에게서 소년에게〉 등 많은 그의 시편에 불교가 알게 모르게 끼어들고 있다. 특히 《백팔번뇌》에 드러나는 ‘님’은, 똑같은 해인 1926년 나온 만해 한용운 시집 《님의 침묵》에 나오는 ‘님’과 비교해 읽어봐도 좋을 것이다.
이광수-시, 소설로 불교적 세계관을 보여주다

“관음봉이란 것은 높은 산에 있는 조그마한 봉인데, 그 봉에서 노장봉으로 나오는 중간 마루터기에 우뚝 선 바위가 있습니다. 그것을 동냥중 바위라 합니다. 그것은 노장봉을 등지고 관음봉으로 향하여 가는 것 같은데, 등에는 배낭 같은 것을 지고 허리를 좀 구부렸습니다. 천연스러운 석상(石像)이외다. 동냥중이란 뜻은 그가 배낭을 졌기 때문이외다. (중략) 나는 이를 베드로 바위라 하여 베드로가 금강산 만이천 식솔들에게 예수교를 전하러 오는 길이라 하겠습니다. 이리하여 중향성(衆香城) 담무갈보살의 반야회에 일대 파란을 일으키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 아니오리까.”
춘원이 1921년과 1923년 두 차례에 걸쳐 금강산을 유람하며 쓴 《금강산유기》한 대목이다. 금강산 절경을 보며 느끼고 깨달은 것을 시조 등의 시가로도 읊어가며 쓴 기행문 형식의 《금강산유기》는 문학사에서 중요한 작품이며 지금도 금강산을 소개할 때 절절이 인용되는 명편이다.
금강산은 인연을 주관하는 법기(法紀)보살이 머무는 산으로, 수만 개의 향불 연기가 안개처럼 띠를 두른 석주들의 봉우리가 중향성이다. 일만이천 봉에도 불교와 관련된 이름들이 많이 붙여진 그 산 곳곳에 있는 절과 암자에서 묵고 여행하면서도, 예수교를 전도한 사도 베드로를 떠올리고 있을 정도로 독실한 기독교도였다. 그런 춘원도 금강산에서 이내 불교에 젖어들고 있음을 《금강산유기》는 잘 보여주고 있다.
고(苦)도 공(空)이요, 낙(樂)도 공이라, 인생이 공화(空華)에서 나오는 것이 모두 공이라. 고는 무엇이며 낙은 무엇이뇨. 고를 피하고 낙을 축(逐)함도 모두 다 공이로다. 사생(死生)도 그와 같으니 생도 공화이며 사도 공화라. 다만 윤회 일선(一線)의 억천 겁을 관통할 뿐이로다. 무궁무제(無窮無際)한 공공(空空) 중에 신비한 겁화(劫火)만이 번뜩이니 나의 성(性)도 그를 따라 명멸하는도다.
황혼은 더욱 깊어가고 바람과 구름은 더욱 재오치니 전신에 전율이 옵니다. 그 전율은 반드시 추운 데서만 오는 전율이 아닙니다. 아아, 인생이여!
관음보살 앞에서 그 밤을 지내고 번쩍 깨어 일기가 어떠한가 하고 창을 여니 흰 구름 한 조각이 휙 날아 들어옵니다.
— 이광수 《금강산유기》
앞서 아내와 함께했던 1차 유람 때와는 달리 이 2차 유람 때의 한 구절은 마치 스님들이 깨달은 바를 읊은 ‘오도송(悟道頌)’ 같다. 2차 때는 석전 박한영 스님과 시조시인 가람 이병기와 도반이 돼 같이 오르며 많은 것을 배웠다. 또 집안의 먼 형제지간인 운허 스님을 우연히 만나, 산꼭대기 벼랑이라 한여름에도 몹시 추운 암자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자다 온몸에 전율이 일 듯 불교의 핵인 ‘공(空)’을 깨치고 있는 대목이다.
“생각하면 내게도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일체 친척이 있고 또 함께 웃고 우는 동족이 있다. 나는 무엇으로 그네 삼생(三生)의 제도(濟度)와 안락을 위하여 축원할 것이고 하고 생각하니 자기의 무위(無爲)한 반생이 부끄럽기도 그지없고 슬프기도 그지없습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도탄의 고통 속에서 제도할 능력이 없을진대 차라리 출가입산하여 천지와 신불(神佛)에게 그들을 위한 읍혈(泣血)의 기도를 드리기로 이 값없는 일생을 바치고 싶습니다.”
금강산 마하연에서 그 절의 보물인 비구 만허행운이 혈서로 쓴 《법화경》 일곱 권, 특히 맨 끝 장에 ‘현재의 부모형제 친척 모두를 위해 혈서를 쓰다’를 보며 마음속 깊이 뜨거운 눈물이 흐름을 금할 수 없다며 쓴 글이다. 이 글을 끝으로 춘원은 금강산에서 내려왔다.
1919년 2월 8일 동경에서 2 · 8 독립선언서를 사흘 밤낮으로 쓴 사람이 춘원이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상해로 건너가 임시정부의 기관지 〈독립신문〉을 맡아 발행하며 조국 독립을 위해 애썼다. 그런 춘원이었기에 일제하 도탄에 빠진 동포들을 제도할 원을 세우고 금강산에서 내려왔을 것이다.
금강산에서 내려온 춘원은 운허 스님이 권한 《법화경》을 읽고 감화돼 대중들에게 널리 읽히려 번역하려 했다. 청담 스님은 그런 춘원을 찾아가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그때부터 춘원은 불교의 독신자가 됐다며 “한국 불교인으로 춘원 이 한 분이 청년 남녀에게 불교의 포교한 것이 대처승 7천 명이 한 것보다도 몇십 배나 더 된다”고 회고했다.
돌아보니 수미산 같은 내 죄
천만겁에도 갚을 길 없으니
땅에 엎드려 임 이름 부릅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마하살(중략)
임 이름 한 번 부르면 천겁의 죄
스러진다고 세존이 가르치시니
목을 놓아서 임 이름 부릅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마하살(〈임〉부분)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은 이름 그대로 세상의 모든 소리, 중생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모든 소리를 듣고 다 들어준다는 대자대비(大慈大悲)한 보살이다. 친일로 낙인 찍혀 해방 후 고통받던 춘원은 운허 스님의 봉선사에서 이런 심정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수행에 정진하다 6 · 25 때 납북돼 북한에서 숨을 거뒀다.
님에게 아까운 것이 없이 무엇이나 바치고 싶은 이 마음
거기서 나는 보시(布施)를 배웠노라.님께 보이고자 애써 깨끗이 단장하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지계(持戒)를 배웠노라.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때림이나 꾸지람이나 기쁘게 받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인욕(忍辱)을 배웠노라.자나 깨나 쉴 사이 없이 임을 그리워하고 임 곁으로만 도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정진(精進)을 배웠노라.천하에 하고많은 사람 중에 오직 임만을 사모하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선정(禪定)을 배웠노라.내가 임의 품에 안길 때에 기쁨도 슬픔도 임과 나와의 존재도 잊을 때에
거기서 나는 지혜(知慧)를 배웠노라.인제 알았노라. 임은 이 몸께 바라밀을 가르치려고
짐짓 애인의 몸을 나투신 부처님이시라고……
— 이광수 〈애인-육바라밀〉
고해의 이 바다를 건너 저 열반의 세계에 이르기 위한 여섯 가지 수행방법을 적은 육바라밀을 쓴 시 〈애인-육바라밀〉이다. 춘원의 이 시는 승려는 물론 대중에게 지금도 널리 읽히며 이 세상에서도 불국토를 이루려는 마음과 실천의 덕목을 알기 쉽게 깨우쳐주고 있다. 《원효대사》 《이차돈의 사》 등 많은 불교소설과 함께 이렇게 시로서도 불심을 일으키게 하고 있으니 청담 스님은 춘원의 불교 포교의 힘을 위같이 칭송했을 것이다.
춘원 시에 드러난 ‘님’은 ‘애인으로 나타난 부처님’이다. 부처님을 실제 연인으로 구체화시키며 육바라밀을 대중에게 절절하면서도 쉽게 전하고 있다.
1920년대 동인지 문단 시대를 이끈 불교적 상상력
육당과 춘원의 2인 문단 시대로 문을 연 한국 현대문학은 1919년 3 · 1운동 이후 젊은이들이 끼리끼리 문예지를 창간해 시와 소설, 평론들을 발표하며 동인지 문단 시대로 들어섰다. 일제의 소위 ‘문화정책’ 아래 언론, 출판의 숨통이 트이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창간과 함께 《창조》 《폐허》 《장미촌》 《백조》 《금성》 《영대》 등 문예 동인지들이 잇달아 창간되며 문필가들의 계몽으로서 문학이 아니라 문학성과 개성을 강조한 본격문학 시대로 접어들며 많은 시인, 소설가들이 나오게 되었다.
아아 날이 저문다, 서편 하늘에, 외로운 강물 우에, 스러져가는 분홍빛 놀…아아 해가 저물면 날마다, 살구나무 그늘에 혼자 우는 밤이 또 오건마는, 오늘도 사월이라 파일날 큰길을 물밀어가는 사람 소리는 듣기만 하여도 흥성스러운 것을 왜 나만 혼자 가슴에 눈물에 참을 수 없는고
아아 춤을 춘다, 춤을 춘다, 시뻘건 불덩이가, 춤을 춘다. 잠잠한 성문 우에서 나려다보니, 물 냄새, 모래 냄새, 밤을 깨물고 하늘을 깨무는 횃불이 그래도 무엇이 부족하여 제 몸까지 물고 뜯을 때, 혼자서 어두운 가슴 품은 젊은 사람은 과거의 퍼런 꿈을 찬 강물 우에 내어 던지나 무정한 물결이 그 그림자를 멈출 리가 있으랴? ……아아 꺾어서 시들지 않는 꽃도 없건마는, 가신 님 생각에 살아도 죽은 이 마음이야, 에라 모르겠다, 저 불길로 이 가슴 태워버릴까, 이 설움 살아버릴까, 어제도 아픈 발 끌면서 무덤에 가보았더니 겨울에는 말랐던 꽃이 어느덧 피었더라마는 사랑의 봄은 또다시 안 돌아오는가
— 주요한 〈불노리〉 부분
1919년 1월에 나온 동인지 《창조》 창간호에 실린 주요한의 〈불노리〉 앞부분이다. 앞에 살펴본 육당이나 춘원의 시와는 형태 면에서 완전히 다른 산문 형태로 우리 현대 자유시의 출발선에 놓인 시로 평가받는다.
주요한(1900~1979)은 평양에서 목사 아들로 태어났다. 일본으로 유학 가 고향 친구인 소설가 김동인과 함께 《창조》를 자비로 창간하고 거기에 이 최초의 현대시를 발표한 것이다. 님이 떠났기에 상심한 가슴을 읊은 이 시의 소재는 사월초파일 평양 대동강의 관등놀이이다. 석가모니 탄신을 축하하며 등을 달고 밤새도록 노니는 이 행사는 신라시대부터 오늘도 연등제로 이어지고 있는 불교 행사이다.
소재적 차원에서뿐 아니라 “사랑 잃은 청년의 어두운 가슴속도 너에게야 무엇이리오, 그림자 없이는 ‘밝음’도 있을 수 없는 것을……. 오오 다만 네 확실한 오늘을 놓치지 말라”고 희망을 불어넣는 시 끝부분에서는 불교적 각성도 드러나고 있다. 육당이 말한 우리 민족으로서 ‘직간접 불교의 감화’가 자유시의 효시인 이 〈불노리〉에도 엿보인다.
우리 조선은 황량한 폐허의 조선이요, 우리 시대는 비통한 번민의 시대이다. 이 말은 우리 청년의 심장을 쪼개는 듯한 아픈 소리다. 그러나 나는 이 말을 아니 할 수 없다.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중략) 우리 청년은 영원한 생명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눈은 늘 무한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겠다. 우리의 발은 항상 무한한 흐름 한가운데 서서 있어야 하겠다. 이러한 태도로 우리는 또한 오해나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자유에 살고 진리에 죽고자 한다.
1920년 창간된 《폐허》 창간호에 실린 공초 오상순(1894~1963)의〈시대고(苦)와 그 희생〉 한 대목이다. 동인지 맨 앞에 실려 당시 조선의 상황을 폐허로 보고 그런 폐허 위에서 무한한 자유와 진리를 바라보고자 하는 젊은 조선 청년으로서의 동인들의 창간의 변을 밝히고 있는 글이다.
“나와 시와 담배는/ 이음동곡(異音同曲)의 삼위일체// 나와 내 시혼은/ 곤곤히 샘솟는 연기// 끝없는 곡선의 선율을 타고/ 영원히 푸른 하늘 품속으로/ 각각 물들어 스며든다” 시 〈나와 시와 담배〉에서 이렇게 읊었을 정도로 공초는 담배를 피우며 담배 연기처럼 세상을 떠돈 시인이다. 해서 담배꽁초이면서도 불교에서 말하는 공(空)마저 초월한 ‘공초(空超)’라는 호를 좋아했다.
서울에서 목재상 아들로 태어난 공초는 1912년 일본으로 가 도시샤대학(同志社大学) 종교학과를 졸업하고 귀국하여 한동안 교회 전도사로 일하기도 했다. 금강산 신계사와 전국 사찰을 주유하며 불교에 감화되어, 1926년에는 부산 범어사에서 출가해 용맹정진 끝에 자신을 괴롭히던 허무도, 공도 없음을 깨닫고 ‘공초’로 자처한 것이다.
“흐름 위에/ 보금자리 친/ 오- 흐름 위에/ 보금자리 친/ 나의 혼……//(중략)// 망망한 푸른 해원(海原)-/ 마음눈에 펴서 열리는 때에/ 안개 같은 바다와 향기/ 코에 서리도다.” 금강산과 전국 사찰을 순례하며 쓴 시 〈방랑의 마음 1〉 첫 연과 마지막 연이다. 공초의 삶과 시 세계를 잘 드러내고 있는 시인데, 수유리 묘지 시비에 새겨져 있다.
공초는 평생 집도 없이 결혼도 하지 않고 지냈다. 인사동 인근 선학원과 역경원, 그리고 조계사 등지에서 자고, 명동에 있는 청동다방에 나가 문인 및 예술인들과 담소를 나누며 6 · 25 직후 명동의 ‘청동시대’를 연 주인공이 공초이다. 그런 공초를 후배 시인 이원섭은 이렇게 회고했다.
“출가하지 않았으나 누구보다도 출가해 있었으며, 무소유의 규율에 매이지 않았으나 누구보다도 무소유에 철(徹)해, 시인이면서도 시에 매이지 않았으며, 불교인이면서 불교마저도 초월했다. 차를 마시고 담소하는 일상사가 곧 신통묘용(神通妙用)일 수 있던 분이 바로 선생이다”라고.
무소유로 일관해 생전에 시집 한 권도 펴내지 않았으나 공초가 남긴 50편가량의 시는 1920년대 동인지 시단 시대의 감상에서 벗어나 불교적 사유로 현대시의 깊이를 더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아시아의 마지막 밤 풍경〉 등 비교적 길고 서사적인 시를 많이 발표하며 현대 장편서사시 형성에 도움을 준 시인이 공초이다.
1933년
지각(地殼)이 얼기 시작하든 첫날,
내 집에 오는 길 전차에서 나는
매우 침착한 소녀를 만낫서라
초생달 갓흔 그의 두 눈썹은
가장 아름다워 그린 듯하고
포도주 빗 갓흔 그의 입술은
달콤하게도 붉었섯다.
그러나 도람직하고 귀여운 그 얼골에는
맛지 않는 근심 빗이 떠도라 잇고,
웬 셈인지 힘을 일코 떠보는 두 눈가에는
도홍색(桃紅色)의 어린 빗이 떠도라라.
— 유엽 〈소녀의 죽음〉 부분
1924년 1월에 나온 동인지 《금성》 2호에 실린 유엽 시인의 〈소녀의 죽음〉 앞부분이다. 총 3연 142행에 이르는 긴 길이에다 시작부터 현대소설처럼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인물을 치밀하게 묘사해나가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 서사시로 평가받고 있다. 전차 안에서 본 소녀와 신문에서 읽은 임산부의 죽음을 교차시키며 가부장적 제도에서 사랑을 못 이룬 소녀가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로 당시 억눌린 시대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시이다.
유엽(1902~1975)은 전주에서 태어나 일본으로 유학 가 와세다대학에서 공부하며 양주동과 만나 1923년 자비를 털어 《금성》을 창간했다. 그 잡지에 김동환 시인을 추천해 1925년 장편서사시 〈국경의 밤〉을 낳게 한 시인이다.
유엽은 〈사(死)의 찬미〉의 윤심덕과 현해탄에서 투신자살한 연극인 김우진, 조명암 등과 1920년 한국 최초의 연극단체인 극예술협회를 조직하고 주연 배우로서 전국순회공연에 나서는 등 우리 현대 연극사를 연 인물이기도 하다. 그런 유엽을 양주동은 “나와 동갑, 술과 한문은 나만 못한 듯하나 미남과 멋쟁이요, 동서의 성악, 기악, 아울러 신시(新詩), 외극(外劇) 등 여러 방면에 그야말로 팔면(八面) 영롱한 재주를 가진 친구였다”고 회고했다.
유엽은 또 1925년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가동맹(KAPF)이 결성돼 시가 너무 정치적 경향으로 흐르자 순수시를 옹호하기도 했다. 1927년 6월 23일 자 〈조선일보〉에 기고한 〈유물사관적 문예론의 근본적 모순〉이란 글에서 유엽은 “리듬을 중시하고, 정확한 언어 사용과 불필요한 수식어 삭제, 그러면서도 자연의 심오한 묘리(妙理)와 우주의 진리를 천진난만하게 노래하는 철인(哲人)이요 도인(道人)”이 될 것을 시인들에게 요구했다.
실제로 유엽은 양주동이 말한 “색계(色界)를 거닐며 공(空)을 외치던 당대의 걸승”이 됐다. 만해 한용운이 주재한 잡지 《불교》에서 일하다 1925년 금강산 신계사로 출가한 후 불교 현대화와 대중화에도 앞장선 걸승으로 불교계에서도 추앙받는 화봉 선사가 유엽 시인이다.
이렇게 계몽주의의 근대시에서 벋어나 현대시에 이르는 도정에서도 불교의 역할은 컸다. 최초의 자유시, 최초의 서사시도 불교와의 직간접적 감화에서 나왔으니. 무엇보다 젊은이들의 감상에 치우친 동인지 시단 시대에 시의 깊이를 담보해준 것이 불교이다.
한용운-현대시에 형이상학적 깊이를 더하다
男兒到處是故鄕 남아 이르는 곳마다 다 고향인 것을
幾人長在客愁中 얼마나 많은 사람들 나그네 시름 속에 머물렀나
一聲喝破三千界 한 소리 크게 질러 삼천세계 깨뜨리니
雪裡桃花片片飛 눈 속에 복사꽃 조각조각 흩날리는구나
만해 한용운(1879~1944)이 “정사년 십이월 삼일 밤 열 시경 좌선(坐禪) 중 바람이 무슨 물건인가를 떨구는 소리를 홀연히 듣고 의정돈석(擬情頓釋)이 되어 얻은 시 한 수”라며 쓴 한시(漢詩)이다. 1917년, 나이 39세에 내설악 오세암에서 좌선하던 한밤중 의심스러운 것들이 갑자기 풀려 썼다는 소위 ‘오도송(悟道頌)’이다.
선(禪)에 대한 이해가 미천할지라도 부처님이나 다른 고승들의 오도송에 비해 비교적 쉽게 이해되는 선시이다. 언어도단(言語道斷) 지경을 어떻게든 언어로 대중들과 소통해보겠다는, 언어를 가지고 작업할 수밖에 없는 시인의 심회(心懷)를 펴려는 노력이 돋보이는 선시이다. 어려서부터 한문에 통달해 천재 소리를 듣던 만해는 절에서 수행하며, 여러 절과 고승들을 찾아다니며 심회를 읊은 한시들을 많이 남겼다.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 머무는 곳마다 주인이며 지금 서 있는 곳이 모두 진리라는 임제 선사의 말이다. 기승전결(起承轉結) 네 구에다, 각 구 7자로 이뤄진 7언절구인 이 시에서 첫 구는 임제 선사의 수처작주를 떠오르게 한다.
‘고향’은 우리네 고향이면서 시공의 흐름에도 변함없이 우리 마음속에 순정하게 간직된 그 고향, 참진의 세계일 것이다. 지금 서 있는 곳이 그런 고향인 줄도 모르고 우리는 또 얼마나 그 고향을 찾아 나그네처럼 떠돌고 있는가 하며 둘째 구에서는 반성으로 나간다.
그러다 셋째 구에서는 한소식해 문득 깨쳐 온 우주 삼천세계를 깨뜨린다. 그러니 눈 속에 복사꽃 꽃잎들이 편편이 날리더라는 것이다. 한겨울에 복사꽃 꽃잎이 휘날린다는 것을 실제로 깨친 것이다. 역설법이 아니라 그런 분별을 초월한 세계를 서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만해는 이 오도송을 쓰고 난 후 세상으로 나와 1918년 월간지 《유심(惟心)》을 창간했다.
심(心)은 심(心)이니라.
심만 심이 아니라 비심(非心)도 심이니 심외(心外)에는 하물(何物)도 무(無)하니라.
생(生)도 심이오 사(死)도 심이니라./ 무궁화도 심이오 장미화도 심이니라.
호한(好漢)도 심이오 천장부(賤丈夫)도 심이니라.
신루(蜃樓)도 심이오 공화(空華)도 심이니라.
물질계(物質界)도 심이오 무형계(無形界)도 심이니라. 공간도 심이오 시간도 심이니라.
심이 생(生)하면 만유(萬有)가 기(起)하고 심이 식(息)하면 일공(一空)도 무(無)하니라./ 심은 무(無)의 실재(實在)오, 유(有)의 진공(眞空)이니라.
심은 인(人)에게 누(淚)도 여(與)하고 소(笑)도 여(與)하나니라.
심의 허(墟)에는 천당(天堂)의 동량(棟樑)도 유(有)하고 지옥(地獄)의 기초(基礎)도 유(有)하니라.
심의 야(野)에는 성공(成功)의 송덕비(頌德碑)도 입(立)하고 퇴패(退敗)의 기념품(紀念品)도 진열(陳列)하나니라.
심은 자연전쟁(自然戰爭)의 총사령관이며 강화사(講和使)니라.
금강산의 상봉에는 어하(漁鰕)의 화석(化石)이 유(有)하고 대서양(大西洋)의 해저(海底)에는 분화구(噴火口)가 유(有)하니라.
심은 하시라도 하사하물(何事何物)에라도 심 자체(自體)뿐이니라.
심은 절대며 자유며 만능이니라
— 한용운 〈심(心)〉
1918년 9월호로 창간된 《유심》에 만해가 직접 쓴 창간사에 이어 ‘시’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실은 〈심(心)〉 전문이다. 주요한의 〈불노리〉를 현대 자유시의 효시로 보고 있는데 그 시보다 5개월 앞서 발표된 이 시를 최초의 현대 자유시로 보자는 학계의 주장도 있다.
이 〈심〉은 한자어가 그대로 실려 생경하나 잡지의 제호 ‘유심’을 알기 쉽고 친근하게 설명하고자 자유시 형식을 취했을 것이다. ‘유심’은 불교적 세계관인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를 줄인 말이다. 세상 모든 것은 다 마음이 지어냈다는 것이다. 그 말만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이 시를 보니 유심의 뜻과 깊이가 잡힐 것도 같다. 아니 불교의 세계, 절대 자유, 해탈을 향한 마음 수행이 뭔지 알 것도 같다.
마음이 모든 것을 낳고 거두니, 해서 삶과 죽음도 하나고 유와 무도 하나이니 그 분별하는 마음을 없애고 마음 본디 자리로 돌아가라는 시이다. 해서 다 깨치고 나니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이듯 첫 행부터 “심은 심이니라”고 내세우며 왜 그런지 열거해가며 ‘유심’에 대해 깊이 있게 들어가고 있지 않은가.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적은 길을 걸어서 참어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든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야서, 한숨의 미풍에 날어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러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골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일인 것 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얐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 한용운 〈님의 침묵〉 전문
우리 국민에게 가장 널리 애송되는 시이다. 사람이면 누구나 한 번은 겪었고 간직하고 있을 사랑을 노래한 ‘사랑의 노래’, 연애시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헤어져 아프지만 지울 수 없는 사랑, 연애의 의미를 아주 구체적으로 반추하고 있어, 제각각의 독자가 다 자기 것처럼 가슴 뭉클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널리 읽히고, 청중들 앞에서 낭송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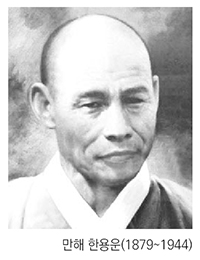
“밤은 얼마나 되얐는지 모르것습니다./ 설악산의 무거운 그림자는 엷어 갑니다./ 새벽종을 기다리면서 붓을 던집니다./(을축 8월 29일 밤 끝)”. 시집 끝에 후기로 실린 〈독자에게〉에 명기해 놓았듯 이 시집은 1925년 8월 29일 늦은 밤 백담사 오세암에서 탈고됐다. 그 직전인 6월 7일, 만해는 그곳에서 《십현담주해(十玄談註解)》를 탈고했다. 그러니 한 2개월쯤에 88편의 시를 탈고한 것이다. 《십현담》은 당나라 말 선승 동안상찰이 10개의 화두를 걸고 그걸 칠언절구 형식으로 이야기한 게송으로 후학이 원주(原註)를 달아 펴냈다. 세조가 조카 단종의 왕위를 찬탈하자 출세의 뜻을 접고 세상을 구름처럼 떠돈 당대의 천재 매월당 김시습이 한때 승려가 되어 오세암에서 수행하며 주석을 붙인 《심현담요해》를 펴내 조선에도 널리 알려져 선승들의 수행이나 마음공부에 지침이 되어오고 있다.
그런 《십현담요해》도 읽은 만해는 동안상찰의 《십현담》 원문 밑에 원문을 비평하는 ‘비(批)’와 원문대로 해석하려 한 ‘주(註)’를 덧붙였다. 가령 ‘심인(心印)’을 내걸고 게송을 쓴 첫 편에서 만해는, 비에서는 “뱀을 그린 것도 벌써 틀렸거늘 발까지 그려서 어쩌자는 것인가”라며 비판했다.
이어서 “마음은 본래 형체가 없는 것이어서 모양을 떠나고 자취도 끊겼다. 마음조차 거짓 이름인데 거기다 인(印)이라는 말을 덧붙일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긴 하나 만법이 이것으로 기준을 삼고 모든 부처가 이것으로 증명하였기에 ‘심인’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따름이다. 이렇게 본체와 가명 두 가지가 서로를 장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심인의 취지가 분명해진다”고 주를 다는 식이다.
이렇게 선의 요체이자 시적으로도 빼어난 동안상찰의 《십현담》을 독자적으로 비판, 주석하면서 만해 또한 많은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리고 잇달아 《님의 침묵》 시편들 시작(詩作)에 골몰했으니 둘 사이의 상관관계가 없을 수 없다.
그만큼 《님의 침묵》은 고단위 관념인 선의 형이상학적 지경을 님을 통해 구체적으로 형상화하려 한 시집이다. 그렇다면 ‘님’은 누구이고 무엇인가.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시집 머리말 격인 〈군말〉에서 만해는 이렇게 밝히고 있다.
‘님’만 님이 아니라 기룬 것은 다 님이다. 중생이 석가의 님이라면, 철학(哲學)은 칸트의 님이다. 장미화의 님이 봄비라면 마시니의 님은 이태리다. 님은 내가 사랑할 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나니라.
연애가 자유라면 님도 자유일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름 좋은 자유에 알뜰한 구속을 받지 않느냐. 너에게도 님이 있느냐. 있다면 님이 아니라 너의 그림자니라.
나는 해 저문 벌판에서 돌아가는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 양(羊)이 기루어서 이 시를 쓴다
연인 사이로서의 님만이 아니라, 그리운 것을 다 님이라고. 그러면서 《십현담주해》에서 비와 주 달듯 님에 대해 깊이 있게, “너에게도 님이 있느나, 있다면 님이 아니라 너의 그림자니라”고 선문답식으로 풀어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런 중생들을 위해 이 시를 쓴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때문에 《님의 침묵》은 선적인 깨달음을 연애시를 빌려 쉽고도 절절하게 전하는 시집으로 볼 수 있다. 아니 가슴 절절한 연애도, 우리네 아등바등한 일상도 다 불교적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편들일 것이다. 다시 한번 〈님의 침묵〉을 읽어보시라. 그렇지 않은가.
“그의 시가 조선어의 운율과 구사를 성공적으로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시로서 충분한 공감과 호소력을 우리에게 발휘하고 있다.”《님의 침묵》이 출간된 직후에 주요한이 1926년 6월 22일 자 〈동아일보〉에 쓴 〈애(愛)의 기도, 기도의 애-한용운 근작 ‘님의 침묵’ 독후감〉 한 대목이다.
자유시의 효시로 평가받는 〈불노리〉를 발표한 ‘전문 시인’ 주요한이 자유시에는 문외한과 다름없는 만해의 《님의 침묵》을 읽고 그 현대시성을 높이 산 것이다. 주요한은 자신의 시 창작 동기를 서양의 현대시가 마음에 들어 한글로 그런 시를 써보고 싶어 처음으로 시험한 것이라 밝히기도 했다. 이 솔직한 고백처럼 우리 현대시, 자유시는 서양시의 모방과 추종에서 비롯됐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런 서양시 이식 과정에서 《님의 침묵》은 멀리 비켜서 있다. 그리고 동인지문단 시대 젊은 시인들의 얄팍하고 감상적인 낭만에 함몰되지 않았다. 문학평론가 김우창의 평대로 우리나라의 향가, 고려가요, 시조, 가사, 한시와 불교에 흐르는 시적 방법과 정신을 고스란히 계승하며 님은 가버려 없고 오실 님은 아직 오지 않은 2중의 궁핍한 시대를 담은 형이상학적 시집이다. 그렇게 불교적 깨달음을 우리 민족의 상황과 마음과 언어로 잘 구사한 《님의 침묵》 한 권만으로도 만해는 현대시사에 우뚝 섰다.
잃은 소 없건마는
찾을 손 우습도다
만일 잃을시 분명하다면
찾은들 지닐 소냐
차라리 찾지 말면
또 잃지나 않으리라
— 한용운 〈심우장(尋牛莊)〉 전문
궁핍하게 사는 자신을 위해 지인들이 모아준 돈과 집터로 만해는 1933년 성북동에 집을 짓고 당호를 ‘심우장’이라 했다. 말년까지 보낸 그 집을 일반 집이 아니라 참선의 공간으로 본 것이다. 그런 집을 제목으로 내세운 시조 단수가 위 〈심우장〉이다.
심우, 혹은 십우(十牛)란 본디의 마음을 소에 비유해 소를 찾는 순서, 즉 선을 닦아 마음을 수련하는 방법을 10단계로 읊은 게송이나 그림에서 나온 말이다. 사찰 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잇대어 그린 탱화가 십우도이다.
그러나 만해는 선승이자 대승답게 그런 참선의 십우도를 훌쩍 뛰어넘고 있다. 위에 살펴본 《십현담주해》에서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마음 도장을 찍느냐 했듯 잃은 마음이 없는데 찾아서 뭐하느냐는 것이다.
이 시를 보면 또 원효의 죽은 자를 위한 염불이 떠오른다. “죽지 말지어다. 다시 태어나는 것은 괴로움이다. 다시 태어나지 말지어다. 죽는 것은 괴로움이다”라는. 살고 죽음이 다 고통이라는 염불이다.
아니 생과 사는 다 하나이니 분별을 떠나라는 것이다. 그렇게 분별을 떠나 대자유, 해탈을 누린 자, 중국이나 다른 나라 어디의 불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깨쳐 우리네 불교를 이룬 자가 원효이다. 그런 원효와 만해는 궤를 같이하고 있다.
“혁명가와 선승(禪僧)과 시인의 일체화-이것이 한용운 선생의 진면목이요, 선생이 지닌바 이 세 가지 성격은 마치 정삼각형과 같아서 어느 것이나 다 다른 양자(兩者)를 저변으로 한 정점을 이루었으니, 그것들은 각기 독립한 면에서도 후세의 전범이 되었던 것이다.”
시인이 되기 전인 1938년부터 심우장으로 만해를 자주 찾아가 가르침을 받았던 조지훈 시인의 만해에 대한 회고이다. 이후 만해는 그렇게 세 측면서 각기 일가를 이룬 인물로 평가돼 오고 있다. 만해 시편들은 삼각형의 세 꼭짓점을 다 포괄하고 있다.
신시대의 시인들과, 중들과, 또 그 밖의 모든 동포 중, 민족의 애인 자격을 가진 이들은 있었으나, 인도자의 자격까지를 겸해 가진 이는 드물었고, 또 인도자의 자격을 가진 이는 있었으나, 애인의 자격을 겸해 가진 이는 드물었다. 그러나 만해 선사만은 이 두 자격을 허실(虛失) 없이 완전히 다 가졌던 그런 사람이다. 이 점, 이 분 이상 더 있지 않다.
미당 서정주 시인이 만해를 기리며 한 말이다. 이 말처럼 만해는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애인의 자격과 민족의 인도자 자격을 허실 없이 다 가진 사람이다. 그런 만해의 인간과 시와 불교는 미당의 풍류와 조지훈의 지조로 흘러들며 한국 현대시의 큰 흐름을 이루게 되었다. ■
이경철
문학평론가 · 시인. 동국대 국문과, 동 대학원 졸업(문학박사). 2010년 《시와시학》(시) 등단. 저서로 《천상병, 박용래 시 연구》 《미당 서정주 평전》 등이 있다. 현대불교문학상(평론 부문), 질마재문학상 등 수상. 현재 동국대 대학원 문창과 겸임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