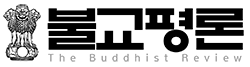필자와의 인연

필자는 2014년 9월 루드비히-막시밀리안 뮌헨대학교(LMU)의 불교학 박사과정에 입학하였다. 독일어는 고사하고 영어도 서툴렀던 필자는 외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 애를 먹고 있었다. 지도교수였던 옌스-우버 하르트만(Jens-Uwe Hartmann)은 매주 월요일 오후 ‘필사본 강독’ 세미나를 운영하였다. 그 세미나에서 교수와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 가며 겨우겨우 공부해 나가고 있었다. 아델하이트 메테 교수도 그곳에서 처음 보았다. 필자의 기억이 정확하다면, 가을에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겨울부터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80세를 넘긴 백발의 명예교수가 온화한 미소를 띠며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세미나실로 들어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박사과정 학생이 발표하는 내내 그는 지적인 호기심을 잃지 않고 경청하였다.
메테는 하르트만의 박사과정 지도교수였다. 그 인연으로 하르트만이 운영하는 강좌 혹은 사적인 모임에서 메테를 만났다. 메테가 학계에서 보여준 지적 호기심과 연구 방법은 독일 학계의 특징을 보여준다. 필자가 그를 소개하고자 결심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비록 필자의 연구 분야가 메테의 연구 성과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그녀의 연구 방법은 필자와 필자 동료들에게 늘 본보기가 되었다. 메테의 학문적 이력을 소개하는 이 글이 독일 불교학계의 지향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메테의 생애
독일 동북부와 폴란드 서북부를 아우르는 지역을 포메라니아(Pomerania)라고 부른다. 메테는 오늘날 폴란드의 뱌오가르트(Białogard, 독일어 Belgard)에서 1934년에 태어났다. 개신교 목사 집안의 맏이로 자랐다.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의 수상이 되는 해가 1933년이다. 그래서 그녀는 어린 시절을 히틀러 치하 독일 제3제국에서 보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직전에 그녀의 가족은 고향을 떠나 그라이프스발트(Greifswald)에 새 정착지를 마련하였다.
1953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함부르크대학에 입학한 그녀는 고전 그리스 문헌학 공부를 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고고학, 철학, 고대사, 인도-유럽어를 함께 공부하였다. 그리고 당시 시간강사였던 한스 요아킴 메테(Hans Joachim Mette, 1906~1986)를 만나 결혼하였다. 1959년에는 그리스 고전 문헌학 분야의 저명한 학자 브루노 슈넬(Bruno Snell, 1896~1986)의 지도 아래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사학위 논문은 〈에우리피데스 드라마에 사용된 에올리안 운율〉이었다.
메테는 독일의 인도학 학자들의 도움으로 연구 분야를 확장해 갔다. 박사학위를 받은 1959년, 인도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원래 의도는 인도-유럽어 역사와 운율에 대한 그의 지식을 심화하는 것이었다. 이 세미나에서 루드비히 알스도르프(Ludwig Alsdorf, 1904~1978)를 만나게 되었다. 알스도르프는 자이나교 연구자였다. 함부르크대학에는 발터 슈브링(Walther Schubring, 1881~1969)이 시작한 자이나교 연구 프로젝트가 있었다. 알스도르프는 슈브링에 이어 이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었다. 알스도르프를 기억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그는 인도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지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현대 인도 국가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깊은 애정을 지니고 있었다. 그의 지식, 열정, 그리고 인도에 대한 애정을 통해 메테는 인도학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자이나교에 관해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1973년 메테는 루드비히-막시밀리안 뮌헨대학교(LMU) 인도-이란학 연구소 조교수로 임명되었다. 1978년 부교수로 승진하고, 1980년 뮌헨대학교 인도 중세어 전공 정교수가 되었다. 그는 고전 인도어 집중 교육 과정을 이끌었다. 인도 중세어뿐 아니라 인도 중세어 공부를 위해 필요한 인도어를 모두 다루었다. 산스끄리뜨어 문법은 물론이고 베다 산스끄리뜨어, 자이나교와 불교 관련 인도 중세어, 비문(碑文) 속 언어 등 수강생들의 관심과 요구에 맞추어 인도학 관련 모든 언어를 가르치고 함께 연구하였다.
1987년 메테는 뮌스터대학교(Westfälische Wilhelms-Universität Münster, WWU)의 인도학연구소 소장 자리를 제안받았다. 1988년 그 직책을 수락하고 2000년 퇴임할 때까지 그 직책을 수행하였다. 연구소 소장은 연구소 운영의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본인이 지향하는 학문 방향대로 연구소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소장 자리는 독일에서 선망의 대상이 되는 직책이다. 또한 당시 뮌스터대학 인도학연구소에는 반시다르 바트(Bansidar Bhatt, 1929~2016)라는 자이나 학자가 근무하고 있었다. 바트는 1985년 뮌스터대학교에 부임하여 자이나교 교육 및 연구를 담당하고 있었다. 자이나교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지니고 있었던 메테에게 뮌스터대학교의 연구 환경은 너무도 매력적이었을 것이다.
2000년 그의 제자와 동료들이 메테의 65세 생일 기념논문집(Festschrift)을 출판하였다. 여기에서 2000년까지 출판된 메테의 연구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많은 동료와 제자들이 그녀의 65세 생일과 정년퇴임을 축하해 주었다. 하지만 메테 본인은 이 시기를 마냥 즐거워할 수만은 없었다. 그의 퇴임과 함께 뮌스터대학교의 인도학과가 폐과되었기 때문이다. 학과 폐과를 막지 못한 것을 매우 안타까워했다고 한다.
메테는 학과 폐과와 함께 뮌스터에서 생활에 대한 미련을 깨끗이 정리하고 뮌헨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현재는 뮌헨대학교의 인도학-티베트학 연구소로 명명된 곳에서 강의를 이어갔다. 독일에도 학부 과정(BA), 석사과정(MA)별로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고, 각 수업은 특정 커리큘럼의 의도에 맞게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메테는 이런 커리큘럼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게 강좌를 구성하는 것이 허가되었다. 그 덕분에 학부 과정 학생부터 박사과정 후 연구원까지 다양한 구성원들이 강좌에 참여하였고, 각자가 원하는 지식을 배워갈 수 있었다. 메테는 다양한 학생들의 요청에 맞게 기꺼이 강좌를 조정하였다. 비록 연구소의 공식적인 교수진은 아니었지만, 많은 학생과 교수가 그를 교수에 준하는 연구자로 대우하였고 그도 적극적으로 학생들과 면담하고 때로는 논문 지도도 하면서 학업에 도움을 주었다.
필자가 메테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2017년이다. 기억력이 조금씩 쇠퇴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활발하게 여행을 다니고 교류 활동을 하던 모습이 그에 대한 마지막 기억이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뮌헨을 떠나 독일 다른 도시로 이사한 후에 뮌헨에 있는 교수와 동료로부터 그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언어에 대한 깊은 애정과 조예를 지닌, 늘 상냥하고 아름다운 표현을 구사하던 노교수가 말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2023년 3월 3일 메테는 뮌헨 근처의 오토브룬(Ottobrunn) 소재 요양병원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메테의 학문적 업적
메테의 박사학위 논문 제목 “에우리피데스 드라마에 사용된 아이올리 운율”을 통해 그녀의 전공이 그리스 고전 그리고 고전문헌에 나타나는 운율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불교학과 다소 거리가 멀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리스 고전어에 기반한 고전 인도-유럽어에 대한 해박한 지식, 운율에 대한 깊은 이해는 인도학, 티베트학, 불교학 연구의 귀중한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는 마치 도교와 유교의 문헌에 대한 지식이 중국불교 연구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것과 같다. 메테의 학문적 이력은 자신의 학문적 자산을 인접 학문에 접목시키는 모범적 사례를 보여준다. 또한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하는 한국 학계가 인도학, 티베트학 분야를 심층적으로 소화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을 보여주기도 한다.

메테는 박사학위 취득 후 루드비히 알스도르프 밑에서 자이나교 및 인도문화를 배우면서 연구 영역을 확장했다. 이 시기 주요 연구 성과물로 자이나교 초기 문헌인 《오하니주띠(Oha-nijjutti)》 분석이 있다. 이 문헌에는 자이나교 승려들의 걸식 수행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메테는 이 내용 연구에 기반하여 1972년 교수 자격(Habilitation)을 취득하고 1974년 연구 성과를 출판하였다.
자이나교 초기 문헌 연구를 위해서는 인도중세어(Middle Indo-Aryan) 장벽을 넘어야 한다. 인도중세어는 산스끄리뜨어와 대비된다. 산스끄리뜨어는 쌍쓰끄리땀 언어(saṃskṛtaṃ vākyam)를 의미하며 여기서 쌍쓰끄리땀은 ‘의도된’ ‘목적이 있는’ 등을 의미한다. 고대인도의 브라만들은 세상의 운행을 위해 제사를 지내는데, 올바른 제사를 위해서 제사 의식에 사용되는 주문을 정확하게 외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제사를 담당하는 브라만이 정확하게 언어를 구사하기 위해서 문법을 규정하고 그 규정대로 구사하는 언어가 산스끄리뜨어이다.
반면 인도 중세어는 산스끄리뜨어 이후 지역, 종교별로 변형/발전된 다양한 언어를 가리킨다. 인도 서북부 간다라어, 동부 아르다 마가디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종교 문헌의 복잡한 전승사 때문에 독특한 언어적 특성을 지닌 인도 중세어가 형성된다. 불교 빨리어(Pāli)와 혼성 산스끄리뜨어(Buddhist Hybrid Sanskrit) 등이 대표적이다. 자이나 초기 문헌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 문헌에 사용된 중세 인도어인 아르다 마가디(Ardha māgadḥī), 마하라슈뜨리(Māhārāṣṭrī) 등을 숙지해야 한다.
뮌헨대학교 박사과정에서 간다라어, 빨리어 등 인도 중세어 공부를 막 시작한 필자는 이 언어들이 반영하는 언어사적 층위에 주눅이 들었다. 동시에 인도 중세어 연구자들의 해박한 지식에 존경심을 느꼈다. 메테는 고전 그리스어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고대 인도-유럽어의 발전 양상을 추적하면서 다양한 인도 중세어를 공부해 나갔다.
스승과 제자가 말소리를 통해 지식을 전달하는 구전(口傳) 전통이 강한 인도 문명에서 운율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각 지역, 종교별로 독특한 운율을 형성한 경우가 많았다. 고전어 운율을 전공하면서 섬세한 언어 감각을 키운 메테는 그 미묘한 차이를 파악하며 인도의 게송, 노래의 역사적 층위를 분석해 나갔다.
이렇게 다양한 인도-유럽어를 익히고 고대 인도 문화를 공부한 메테는 1973년 단행본을 출판했다. 이 저작은 자이나교 문헌 《바수데파힌디(Vasudevahiṇḍi)》 그리고 《아바샤까니륙띠(Āvaśyaka-niryukti)》와 그 주석에 기록된 고대 인도의 역사관을 분석하고 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헌 중에는 시대의 흥망성쇠를 서술하고 있는 텍스트들이 있다. 메테는 자이나 문헌을 중심으로, 이 주제에 관한 고대 그리스-로마와 고대 인도의 서술 방식을 비교 대조하였다. 이런 연구가 인도는 물론 인도-유럽 문명 전반에 대한 이해에 크게 기여하였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중국 고대 문학을 연구할 때 중국 북방의 《시경(詩經)》과 중국 남방의 《초사(詩經)》를 비교 연구하여 중국 고대 문학 전반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는 것과 유사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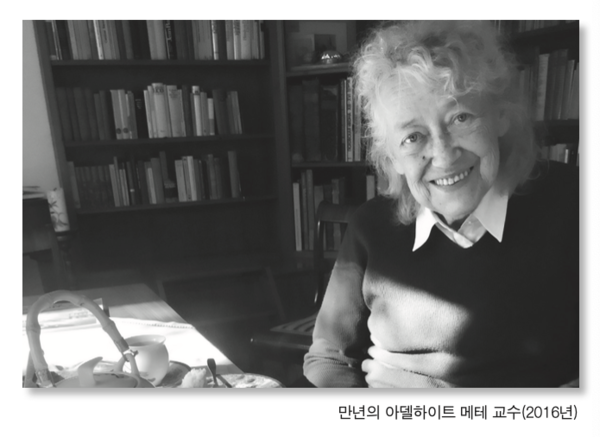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메테는 1973년 뮌헨대학교에 부임한 이후 다양한 인도어 수업을 개설하였다. 지인의 회고에 따르면, 베다 산스끄리뜨 수업에서 메테는 리그베다(Ṛgveda), 그리고 리그베다의 동시대 저작을 함께 소개하면서 이 시기 문헌들의 특징을 매우 흥미롭게 조망해 주었다고 한다. 이렇게 학생들의 학문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베다 산스끄리뜨 수업을 하면서 동시에 베다 산스끄리뜨어에 대한 연구 성과도 출판했다. 대표적으로 산스끄리뜨어에서 ‘yoj’와 ‘yoga’ 간의 관계에 관한 논문이 있다.
뮌헨대학교에서 메테의 연구는 인도와 티베트 불교학으로 확장되었다. 불교 원전 자료에 대한 지적 호기심과 문헌학적 관심을 바탕으로 크게 두 분야에 천착하였다. 첫 번째는 길기트(Gilgit) 사본 연구였다. 길기트는 북부 파키스탄 지역으로서, 기원후 6세기에서 8세기 무렵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교 사본이 다량 발견되었다. 이 불교 사본 컬렉션을 길기트 사본이라고 부른다. 발트슈미트(Ernst Waldschmid, 1897~1985), 베허트(Heinz Bechert, 1932~2005) 등 많은 독일 불교학자가 이 사본 연구에 참여했다. 메테도 이 연구 프로젝트에 관계를 맺으면서 해당 사본에 대한 전체적 이해를 갖추고 《까란다뷰하(Kāraṇḍavyūha)》라는 대승불교 경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다. 《까란다뷰하》는 관세음보살(Avalokiteśvara)의 미덕을 찬미하는 만트라 문헌이다. 이 문헌은 길기트 사본 외에 네팔에서 발견된 사본이 있다. 메테는 두 사본의 비교 연구를 반영하여 길기트 사본 비평 편집본을 출판하였다.
뮌헨대학교에서 수행한 메테의 두 번째 분야는 밀라레빠(Mila-repa)였다. 티베트의 성자이자 고행자였던 밀라레빠는 노래와 시로도 유명하였다. 국내에도 《미라래빠의 십만송》(이정섭 역, 2001, 이하 《십만송》)이라는 제목으로 그의 노래가 번역되어 있다. 《십만송》에는 밀라레빠의 일생이 성인전(聖人傳, hagiography, 인물의 영웅적, 신화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된 전기)의 형태로 포함되어 있다. 메테는 먼저 밀라레빠에 대한 다양한 성인전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사본과 출판 편집본을 비교하며 《십만송》의 노래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밀라레빠 성인전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전승사를 밝혀냈다. 또한 《십만송》이 단일 저자에 의한 저작이 아니라 다양한 전승이 통합된 후 집대성이 된 것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아쉽게도 메테는 이렇게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연구의 결과물을 단 하나의 논문으로만 출판하였지만, 이 논문 하나만으로도 그의 철저하고 광범위한 연구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뮌스터대학교에 부임한 메테는 1991년 자이나교에 대한 개론서를 출판했다. 세밀하고 심층적인 학술연구와는 별도로, 독일의 다양한 대중에게 자이나교와 자이나 문헌을 소개하고자 하는 열망 때문이었다. 그는 이 종교의 핵심 사상을 소개하기 위해 자이나 텍스트에서 주요 문장들을 발췌하고, 그 문장에 대한 번역과 간략한 주석을 제공하였다. 이 저작은 인도학 훈련을 받지 않은 대중들에게도 자이나교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훌륭한 입문서라는 점을 인정받았다. 이후 이 저작의 수정증보판이 베를린의 세계종교(Weltreligion) 출판사에서 출판되었다.
메테는 일생 동안 운율과 인도중세어에 대해 관심 있는 학생들을 적극 환영하였고 그들을 돕는 데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스 고전 운율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 자이나교 문헌에 대한 교수자격 논문을 고려한다면, 이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다. 필자의 동료들도 운율이나 인도중세어 관련해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생기면, 이 노교수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였다. 시의 리듬과 억양에 대한 섬세한 감각과 호기심을 가지고 있던 메테는 운율에 대해 토의하는 자리를 항상 즐거워하였다. 메테의 제자이자 뮌헨대학교 인도학-불교학 연구소장이었던 하르트만은 늘 메테의 언어학적 감각과 인도 운율에 대한 폭넓은 지식에 감탄하였다고 한다. 그런 메테의 지식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르트만은 메테에게 인도 운율에 대한 간략한 매뉴얼이라도 출판하기를 강력하게 권하였다. 다음 세대들에게 그의 지식을 남기기 위해서 수 차례 제안하였지만, 끝내 성공하지 못하였다. 하르트만의 회고에 따르면, 메테는 매뉴얼이라는 것이 학문적으로 큰 도전을 요구하는 작업도 아니고 독자에게 신선한 통찰을 주는 출판물도 아니라고 했다고 한다. 그런 저작을 굳이 출판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연구 및 출판에 대해 엄격한 독일학자의 특징을 여기서도 엿볼 수 있다.
학문이 점차 세분화, 전문화되고 있다. 사서삼경(四書三經)과 노장(老壯) 사상에 대한 해박한 지식 위에 중국 초기 불교를 연구하는 학자, 성리학(性理學)과 도교(道敎)와 함께 중국 선불교를 연구하는 학자, 인도철학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여 인도불교를 연구하는 학자 등 폭넓은 지식을 갖춘 대가급 불교학자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인접 학문에 관심을 갖는 태도가 학문적 사치로 간주되고, 학자들은 생계를 위해 많은 저작을 출판하기를 요구받는다. 진지한 학자와 작업하며 학술적으로 의미 있는 논문 몇 편을 쓰는 것보다 인용지수가 높은 학술지에 최대한 많은 논문을 ‘생산’하는 것이 취직에 유리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는 비단 한국학계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전 지구적 현상이다. 독일도 더 이상 메테와 같은 유형의 학자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오늘날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또 현대 학계의 풍토가 전적으로 단점만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선배 학자들의 학문적 이력을 되짚어 보며 오늘날 학술적 풍토를 성찰하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한다면, 학계를 건설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AI와 빅데이터 등 미래 기술이 지닌 잠재력을 선배 학자들이 추구한 다학제적 혹은 융합적 연구에 사용한다면, 새로운 학문 방향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아델하이트 메테의 생애와 연구 성과가 이러한 모색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최성호 literguy@gmail.com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동 대학원 철학과 졸업(석사). 독일 뮌헨대학교(LMU) 불교학 박사. 인도 불교철학 및 언어 전공. 서울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독일 라이프치히대학교 강사 역임. 주요 저서로 《철학과 현실 현실과 철학》(공저), 《고전티벳어문법》(공역)이 있고, “Two Contemplation Models of Nāmamātra in the Yogācāra Literature”(Religions) 등 다수의 논문 발표. 현재 경남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 연구교수.